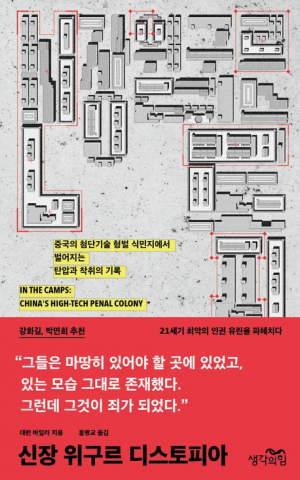“오직 국어(중국어)로 말아라, 애국하라, 조국에 해로운 것에 반대하라, 이 방 안에 종교란 없다, 벽에 걸린 TV를 비롯해 어떤 것도 손상시키지 말라, 싸우지 말라, 누구도 비밀 대화를 할 수 없다, 누구도 다른 방의 교육생들과 대화해선 안 된다, 자신의 의자에 앉아라.”
중국 서북 지역 신장웨이우얼(신장위구르) 출신으로 후이족(回族)인 베라 저우가 2017년 구속돼 감방에 구금됐을 때 강제로 암기한 열 가지 규칙이다. 미국 워싱턴대에 다니던 그는 남자 친구를 만나러 고향을 찾았다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공안은 저우가 대학 지메일과 같은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잠재적 테러리스트’이자 ‘예비 범죄자’로 간주했다.
저우가 끌려간 수용소에서 최소 600명의 사람들이 수감돼 있었다. 수감자들은 공포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점차 인간성이 말살돼 갔다. 저우는 사방이 꽉 막힌 감방을 통해 전염병처럼 옮아가던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 한다. 한 젊은 엄마가 밤이 되면 집에 둔 젖먹이 아기 사진을 보면서 울자 교도관이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질렀다. “다시 또 울면, 사진까지 빼앗아버릴 거야.”
최근 번역 출간된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신장웨이우얼 지역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과 인종 청소의 참상을 고발한 책이다. 저자는 인류학자인 대런 바일러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국제학 조교수다. 좌파 성향의 그는 저우를 비롯해 수용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카자흐족 청년, 수감자들의 중국어 강사였던 우즈베크인, 강제 노동을 당한 카자흐인 등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국이 첨단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해 착취하고 있는 현장을 폭로한다.
위구르 토착민들은 과거 옛 실크로드를 따라 군소 국가들을 세워 2000년 이상 자치를 누려왔다. 그러나 청나라가 1755년 침공한 뒤 1949년 스탈린과 마오쩌뚱이 중국 내부 식민지로 만들기로 밀약하면서 비극의 단초가 마련됐다. 특히 중국 정부가 1990년대부터 수출 주도 시장경제로 전환하며 석유·천연가스의 보고이자 면화·토마토 산지인 신장 지역으로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갈등이 커졌다. 생활 물가가 폭등한 가운데 원주민들은 점차 외곽이나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났다. 이 같은 한족 우대 정책은 지역민의 저항과 폭력을 불러왔다.
시진핑 정부는 일부 극단론자들의 테러를 빌미 삼아 2014년 ‘테러와의 인민 전쟁’을 선포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소수의 범죄자가 아니라 신장 내 위구르족 1200만명, 카자흐족 150만명, 후이족 100만명 등 1500만 명의 무슬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2017년 초 ‘인터넷 보안법’이 시행되자 이 지역 무슬림들의 일상 생활은 거대한 디지털 네크워크 감시망에 노출됐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모두를 위한 신체 검사’를 통해 모든 거주민의 얼굴·홍채·목소리·혈액·지문·DNA 등 각종 생체 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인클로저 시스템에 저장됐다. 또 지역민들의 스마트폰을 추적 장치로 바꾸어 언제 어디로 가는지 감시했다.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는 모니터를 통해 얼굴 스캔과 신분증 검사를 수시로 자행한다. 조지 오웰의 ‘1984’과 같은 디스토피아 소설에나 나오는 ‘빅 브러더’가 마침내 신장웨이우얼에서 현실화한 것이다.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신분증에 무슬림으로 적시돼 있으면 소지자를 체포해 ‘재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이슬람의 메시지를 들어서” “종교 모임에 참석해서” “스마트폰에 왓츠앱을 설치해서”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끌려갔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총 385곳의 구금 시설에 150만여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토착민 인구의 10%에 이른다.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지금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수용소 불빛과 카메라 아래 24시간 감시 당하면서 구타와 고문, 굶주림, 더러운 화장실, 춥고 냄새나고 비좁은 공간 등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폭로다. 정신적으로는 고유한 전통·문화·종교를 지우기 위해 사상 재교육 프로그램 영상을 무한 반복해 듣고 당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아비판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다. 여성들 대상으로는 ‘불법 출산 제로’ 정책이 실시됐다.
“내가 인터뷰한 많은 수감자들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인간성의 일부를 상실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사회성과 잔혹성을 향해 내몰리고 있다고 느꼈다.”
나아가 저자는 유례없는 스마트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배후에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기업들이 수행한 역할도 짚는다. IBM과 아마존, 구글 등 미국의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이 중국의 감시기술 개발에 얽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 글로벌 테러리즘 담론, 미국 산업 연수는 오늘날 중국 기업이 얼굴과 음성 인식에 있어 세계를 주도하는 세가지 이유”라며 “수감자들이 경험한 비인간화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시애틀에서 베이징을 아우르는 컴퓨터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불안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옮긴이 홍명교는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좌파의 침묵’을 비판한다. 그는 “좌파는 신장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혐오 탄압을 옹호하는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대런 바일러 등 좌파 연구자 35인의 공개 서한을 인용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