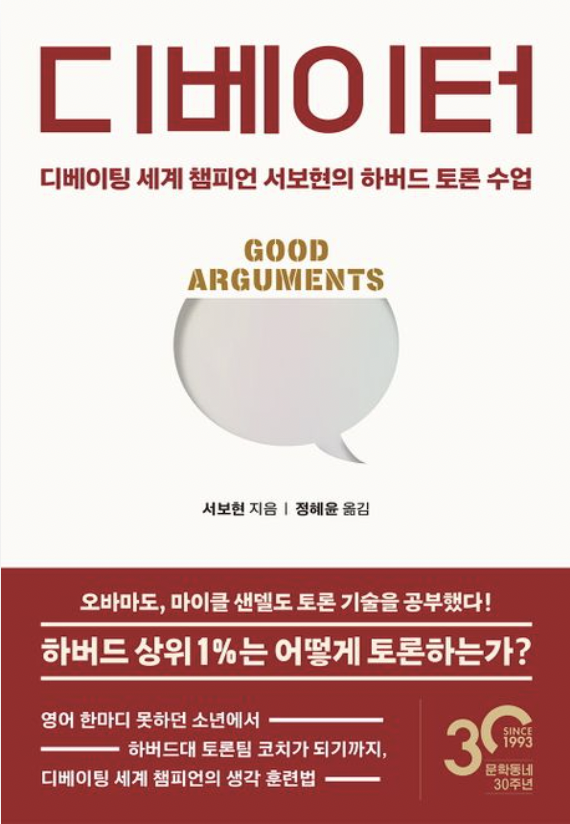“우리는 사는 곳 바깥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채 생각의 기차를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
‘좋은 토론’을 묘사하는 데 이보다 더 적확한 문장이 있을까. ‘디베이터’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 토론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디베이팅(토론) 챔피언이자 세계 최우수 토론팀 하버드대 토론팀 코치를 지낸 서보현 작가의 일종의 성장도서다.
만 8세 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떠난 저자는 이민 초기 언어장벽으로 인한 숱한 차별에 시달린다. 이민 초기 저자는 어떤 논쟁에도 끼어들지 않고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세웠다. 그러다 5학년 무렵 들어간 학교 토론팀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 토론팀은 반대 의견을 말해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 한국인으로서도 호주 이민자로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법같은 세계였다. 내 의견을 명료하게 밝혀도 불화가 생기지 않고, 꼭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거나 ‘내 주장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규칙도 없었다.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고, 논쟁적인 주제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혀보는 일 자체가 저자에게는 편안한 여행이었다. 그는 토론 훈련을 통해 ‘건강한 소통’을 체득한다. 뿐만 아니다. 토론팀 활동은 저자를 지역토론대회, 세계학생토론대회 출전 등 거침없는 토론의 세계로 이끌었고, 한국인 최초의 베스트 스피커 타이틀을 거머쥔 이후 하버드대 조기입학, 하버드대 상위 1% ‘주니어 24’ 선정 등의 ‘스펙’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
저자는 책의 대부분을 자신의 토론 대회 준비 과정에 할애한다. 토론대회 참가자는 논제 파악과 논증방법, 수사법등 갖가지 고난도의 말하기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토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 토론대회 준비는 그 자체로 고도의 인문학 훈련인 셈이다.
게다가 토론대회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시간과 공정한 판단을 보장받는다. 상대의 주장이 엉터리 같아도 답변은 해야 한다. 토론대회는 ‘누가 더 좋은 의견을 냈느냐’가 아닌 ‘어느 쪽에 더 설득 됐는가’라는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토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누구도 참가자의 의견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승리했다고 무조건 옳은 의견도 아니다. 저자는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전달했는가’라는 말하기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하버드대 1%가 아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많은 정치·사회적 논쟁의 기로에 선다. 그리고 대부분은 논쟁을 회피한다. 상대의 의견을 반대함으로써 생기는 불화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 환경, 젠더 등 우리 공통의 이해가 걸린 문제를 숙의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나아가 그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사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무다. 토론을 회피하는 일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기도 하다.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