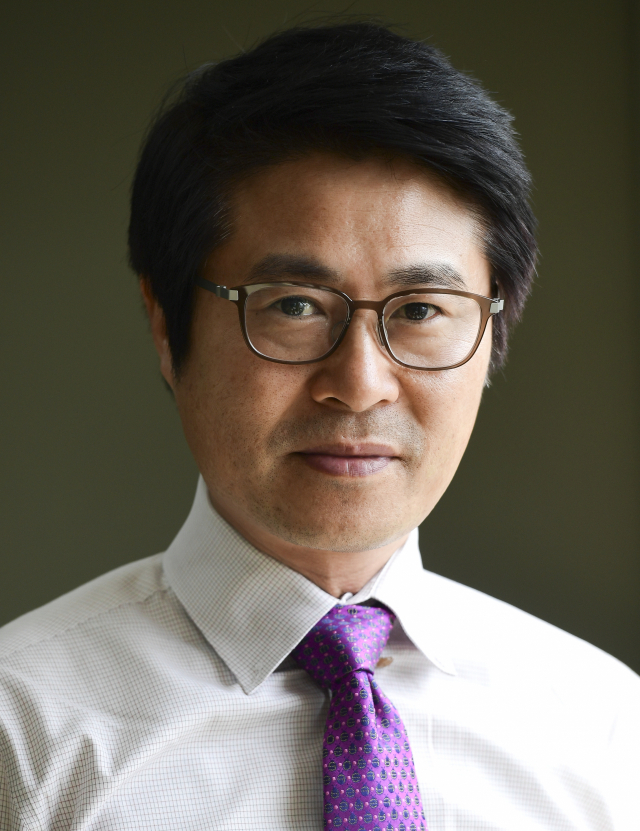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진행된 최저임금 협상에서 16.4%라는 역대 두 번째로 큰 파격적인 인상률이 결정됐다. 정권의 기반이던 근로자들은 열광했고 사업주는 고개를 떨궜다. 당시 협상에 나섰던 한 공익위원에게 인상률의 근거를 따져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올해 이 정도는 올려야 이번 정권 임기 내 1만 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근거가 된 것이다.
그로부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여섯 번의 최저임금 논의가 더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나다. 협상 상대방의 처지는 아랑곳 않고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황당한 인상률은 노사 갈등만 키우고 있다. 합리적 사고를 앞세워 최대한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적정 임금을 찾기 위한 ‘진실성’은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1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자취를 감췄다.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느새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의 진영 싸움으로 변질돼 고착화됐다.
지난달 초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벌써 열한 번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양측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이다. 서로가 자존심 싸움만 지속하는 모양새다. 몇 번의 회의에서 양측은 고작 몇십 원의 간극만 좁혔다. 결국 가식적이고 서로에게 치욕을 안겨주기 위한 ‘양보의 탈을 쓴 공격’만 있을 뿐이다.
노동계는 협상 전부터 올해(9620원)보다 24.7%를 올려야 한다고 엄포를 놓더니 급기야 최초 제시안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26.9%를 내놓았다. 어차피 사용자 측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스스로의 정당성만 강조한 셈이다. 사용자 측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속에서 소비자물가가 3% 넘게 올랐는데 정작 동결을 내걸었다. 어차피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던진 셈이다. 노사 서로가 정말 협상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같은 최초 제시안을 내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뜩이나 노정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양보는 고사하고 불신의 골만 키우는 꼴이다. 덕분에 올해도 최저임금 노동계 위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피켓 시위를 하는 퍼포먼스를 잊지 않았다.
협상이라는 게 대부분 당초 제시한 안에서 접점을 찾아 타결되기 마련이다. 인생사에서 갈등을 풀어줄 열쇠는 항상 당신과 나 사이의 어디쯤에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사가 스스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공익위원의 손에 넘어가 결정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게 더 큰 문제다. 1988년에 도입돼 서른여섯 차례 진행된 최저임금 논의가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고작 일곱 차례에 그쳤다. 우리나라 노사 협상력이 얼마나 초라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의 비생산적인 최저임금 논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예사롭지 않다. 현재 노사공 각 9명씩 27명의 심의위원이 마치 대결하는 듯한 구도가 아닌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사업장, 노동 현실 등을 제대로 반영하는 최저임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미국·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지역·업종별 차등화된 최저임금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완고한 노동계의 반발에 매년 헛물만 켜고 있는 것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처한 현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탓에 어떻게든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는 ‘액수’만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보여준 모습이 곧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협상 수준이라는 점을 당사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