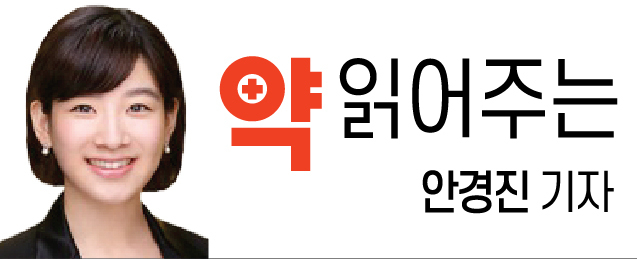전통제약사 종근당(185750)이 최대 13억500만 달러(약 1조 7302억 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수출 계약의 주인공이 되며 모처럼 제약·바이오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신약 연구개발(R&D) 이력이 짧은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감수한 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글로벌 임상시험을 완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신약 임상 경험이 부족한데 해외 연구자들을 밀착해서 관리하기도 녹록지 않거든요. 지난해 연결 기준 1조 4883억 원의 매출로 제약업계 3위에 오른 종근당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종근당의 전신은 1941년 고(故) 이종근 명예회장이 서울 아현동에 차린 4평 규모의 약방입니다. 자본금 65원으로 ‘궁본약방(宮本藥房)’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의약품 판매를 시작해 생산, 공급 등으로 차츰 사업 저변을 넓히다 1956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종근당 제약사’로 개명했다고 해요.
사실 82년의 업력에 비해 종근당의 R&D 성과는 초라했습니다. 2004년 3월 캄토테신계 항암제 ‘캄토벨주(성분명 벨로테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0년만에 치아졸리딘디온(TZD) 계열 당뇨약 ‘듀비에정(성분명 로베글리타존)’까지 신약 2종을 상업화한 게 전부였죠.
올해 6월 미국 아클립스테라퓨틱스의 자회사 아클립스 투와 ‘듀비에’의 글로벌 개발, 허가, 상업화에 관한 독점권(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제외)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 규모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종근당의 R&D 성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지 않았던 터라 스위스의 대형 제약사 노바티스와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소식이 더욱 반갑게 여겨집니다.
국내 기업들은 ‘라이선스 아웃’의 전체 계약 규모를 부각하곤 하죠. 그런데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milestone·단계별 기술료)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산업군의 수주 계약과는 지불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흔히 ‘업프론트’라고 불리는 확정 계약금(upfront payment)은 계약 당시 기술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통상 계약 직후나 일정 기간 이내 입금됩니다. 향후 계약이 변경 또는 파기되더라도 반환할 의무도 없죠. 반면 마일스톤은 전임상 → 임상 → 허가신청 → 품목허가 등 신약 개발 단계별로 나눠 책정됩니다. 일종의 성공 보수 개념이라 임상 경과가 좋지 못하거나 경쟁 신약의 성과에 따라 시장성이 하락하는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으로 개발이 중단될 경우 일정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뱉어낼 의무가 없는 확정 계약금이 총 계약 규모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미약품(128940)은 지난 2015년 사노피에 당뇨 신약후보물질 3종의 라이선스를 넘기는 조건으로 최대 39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제약업계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추후 계약이 몇 차례 수정되다 5년 여만에 권리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선급금으로만 2억 400만 유로를 확보해 나름 성공적인 계약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종근당이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선급금은 8000만 달러(약 1061억 원)로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보다 많은 선급금을 확보했던 국내 기업은 한미약품, SK바이오팜(326030) 두 곳 뿐이죠. 2019년 SK바이오팜에 계약금 1억 달러를 안겨줬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가 3상 임상을 마친 상태였음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가치를 인정 받은 셈입니다.
노바티스를 사로잡은 종근당 신약의 매력은 뭐였을까요? 종근당은 자그마치 2010년부터 이번 딜이 성사된 HDAC6 저해제의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HDAC·Hystone Deacetylase)는 후송유전학의 주요 조절인자 중 하나로 아세틸화, 쉽게 말해 단백질 변형을 제거하는 효소입니다. 그간 HDAC 효소의 여러 아형들을 억제해 질환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암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에서 HDAC 저해제의 활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노바티스는 2015년 HDAC6 저해제 ‘파리닥’을 다발골수종 치료제로 개발해 미국식품의약국(FDA) 가속 승인까지 받았으나 시장성을 이유로 세큐라바이오에 판권을 매각한 전력도 있습니다. 세큐라바이오는 추가 임상 단계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기 못해 파리닥의 신약허가신청(NDA)을 자진 취하하고 말았죠. 종근당이 개발해 온 ‘CKD-510’이 상업화에 성공하면 계열 최초 신약(first-in-class)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CKD-510는 현재 시판 중인 HDAC 저해제와 달리 비히드록삼산(NHA·Non-Hydroxamic Acid)에 기반해 히스톤 단백질과 DNA의 상호작용을 돕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유전 독성, 짧은 반감기, 광범위한 대사체 활성 등 히드록삼산(HA·Hydroxamic Acid) 기반의 HDAC6 저해제에서 보고됐던 문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죠. 유럽 1상 임상을 마쳤으니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항암제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자가면역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타깃해 개발하면서 작용기전이 유사한 과제들과 차별화된 시장을 공략한 점도 매력적 요소로 꼽힙니다.
종근당이 글로벌 빅파마와의 첫 계약에서 마일스톤을 모두 달성했을 때 수령 가능한 총 계약금 대비 선급금 비중이 6.1%나 되는 제법 괜찮은 조건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건 △혁신 신약으로서의 잠재력 △유럽 1상 임상 시험을 완료해 다음 개발 단계(2상 임상)로 진입이 용이 △경구용 제형 등의 장점 덕분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복용이 편리한 경구용 약물이 유효성과 안전성을 갖춘다면 의약품 시장에서 더욱 환영받 게 마련이니까요.
종근당의 빅딜에 가리워 상대적으로 빛을 못 봤지만 국내 비상장 바이오벤처 오름테라퓨틱도 지난 6일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과 항CD33 항체 기반 GSPT1 단백질 분해제 ‘ORM-6151’ 개발 과제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ORM-6151은 올해 초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고위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관련 1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물질입니다. 오름은 이번 계약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1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추가 마일스톤을 포함하면 최대 총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인데요. 세부 계약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평가하긴 어렵지만, 전체 계약금 가운데 선급금 비중이 55.6%에 달한다니 이례적이네요. 이들 기업들의 거래가 오랜 기간 기술수출 가뭄을 겪어 온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