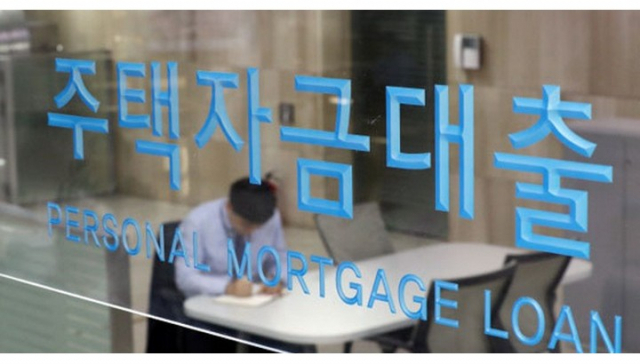국회가 연체이자를 제한하고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횡재세에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과도한 ‘표풀리즘’ 정책이라며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영업 활동을 위축시켜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주요 금융법안에 대한 논의를 4개월 만에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와 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채무 조정 활성화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불가 △채무조정·추심 예정일 등 미리 통지 △추심 횟수 7일 7회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 채무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문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기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대상이라는 점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정부가 내놓은 대출 원금 3000만 원에서 확대해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야당은 당론을 모았다. 반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해 적용 대상 확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병합 심사 과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야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전까지 시일이 촉박한 데다 거야(巨野)가 밀어붙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대된 기준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선 전까지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 역시 금융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연체이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대출 잔액 전체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5월 0.37%에서 6월 0.33%로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 7월 0.36%, 8월 0.38%로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정무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채권금융회사의 대출 중 원금 3000만 원 이하의 대출 건수는 73% 정도다. 하지만 전체 금액 중에서는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회사 자체에 미치는 손실은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이 원금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될 경우 상당수의 차주들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절반에 가까워져 금융회사의 손실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법안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면제하고, 대부채권을 매입할 때는 채권을 담보로 한 조달 자금의 비율을 75% 이내로 규제하는 등 채권 시장이나 금융회사의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도 적지 않다. 부실채권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줄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출채권의 가격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은행이나 저축은행 역시 기대 수익이 낮아진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안은 한 번 만들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금융 환경이 언제 변화할지 모르는데 채권 매입 시 담보 조달 비율이나 추심 횟수 등을 법적으로 못 박는 건 ‘제2의 법정 최고금리’ 사례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