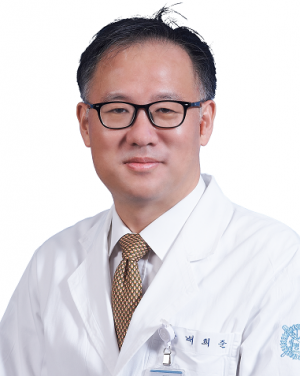의학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뇌졸중 발병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사망률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연구팀은 2008~2019년 전국 17개 병원에서 모집한 18~50세 뇌졸중 환자 7050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뇌졸중은 갑자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한다. 뇌졸중은 흔히 고령층에서 생기는 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체 뇌졸중의 약 10~15%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18~50세 사이에 발병한다. 젊은 환자들은 뇌졸중에 따른 후유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대여명이 짧은 고령에 비해 질병 부담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젊은 뇌졸중의 평균 발병 연령이 12년만에 43.6세에서 42.9세로 낮아졌음을 확인했다. 여성의 경우 18~30세에 뇌졸중이 발병한 환자의 비중이 6.5%(2008~2010년)에서 10.2%(2018~2019년)로 10년새 3.7%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은 4.1%에서 5.5%로 1.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동안 치료 성적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최신 진료 지침에서 요구하는 △혈전용해제 투여율 △혈전제거술 시행률 △스타틴 투여율 △복합항혈전제 사용률 등 치료 지표는 좋아졌지만 △사망률 △기능적 회복률과 같은 치료 결과 지표들은 변동이 없었다. 1년 내 재발률은 4.1%(2011~2013년)에서 5.5%(2017~2019년)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혈관재개통치료 지표 개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전체 뇌졸중 환자의 20%에 불과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증상 발견 후 병원 도착까지 시간이 8시간으로 1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젊은 뇌졸중 환자의 예후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뇌졸중은 빨리 치료할수록 뇌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 12년 동안 병원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거의 단축하지 못했다는 게 연구팀의 지적이다.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뇌졸중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한 인지율과 치료율이 그대로거나 악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밖에 젊은 여성의 흡연율 증가 등이 거론됐다.
뇌졸중은 나이를 가리고 찾아오지 않는다. 뇌졸중 의심 증상은 ‘이웃, 손, 발, 시선’으로 기억하면 쉽다. ‘이웃, 손, 발, 시선’은 △이~하고 웃지 못하는 경우(안면마비) △두 손을 앞으로 뻗지 못하거나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더 없는 경우(편측마비)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실어증 증상이 있는 경우(구음장애 및 실어증)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안구편위)의 약자다.
배희준 교수는 “젊은 연령에서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원인 질환을 앓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평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민들이 개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심인성 색전증 등 항응고제 사용이 필요한 뇌졸중을 선별하기 위한 연구와 치료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고 미국뇌졸중학회의 공식학술지(Stroke) 최근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