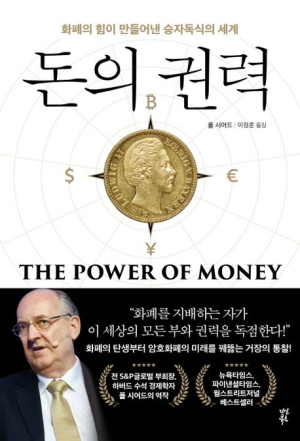균형재정과 통화안정이 지상명제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몇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세계 경제와 금융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돈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침체에서 벗어나 미국 경제는 부활하고 있고 또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의 탈출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경제위기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도 돈을 풀면서 위기에 대응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돈 찍어내기’라고 비난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 경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신간 ‘돈의 권력(원제 The Power of Money)’은 이른바 ‘현대화폐이론(MMT·Modern Monetary Theroy)’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의 화폐의 새로운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한때 비주류였던 MMT은 잇단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확고한 토대를 구축했다.
MMT는 정부가 세금을 걷는 만큼만 써야 한다는 균형재정 개념을 부정한다. 오히려 정부가 돈을 찍어내 인프라나 복지 등에 투자하면 할 수록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는 것도 용인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저자는 ‘돈’의 유래부터 설명한다. 흔히 우리는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독립’된 중앙은행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는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 중 중요도가 가장 낮다. 오히려 상업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
상업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돈을 만들어낸다. 보통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새로운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또는 정부가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때, 즉 적자예산을 집행할 때 돈이 시중에 풀리며 돈이 만들어진다.
적자예산이 오히려 돈을 만든다는 개념은 자칫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부가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논리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실제로 몇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뒤 국가 부채는 더욱 많아졌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 또한 깊어졌다. 국가의 부채는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며 그 엄청난 부담을 우리의 자손들이 질 것이라고 생각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부채는 그것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자산이며,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가 일궈 놓은 막대한 생산 자본과 과학, 기술 등의 사회적 자본까지 물려받을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정부 부채로 인한 부담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적절한 규모와 역할은 무엇인지,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이다.
저자는 자신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역시 자신이 몸담았던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는 혼란상을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적완화를 옹호하는 MMT을 토대로 돈의 원리와 지금의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한다. “양적완화는 국채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만 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두 가지 형태의 정부 자금이 바뀌는 것뿐이다.” 저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풀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 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2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