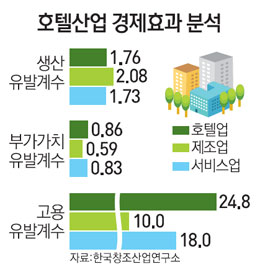|
|
|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다 보면 4m 높이의 담벽이 300여m가량 길게 이어진 곳이 있다. 무려 3만6,600㎡(1만2,000평)의 빈 땅에 잡초만 무성하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생경하기도 하다. 바로 여기가 호텔 건축을 둘러싸고 국내 대기업과 정부ㆍ서울시ㆍ교육계ㆍ문화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직원숙소였던 부지다.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은 이곳에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도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ㆍ관광산업진흥을 이유로 적극적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교육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문화계도 부정적이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은 이곳이 경복궁이라는 초대형 문화재가 있는 바로 옆인데다 풍문여고ㆍ덕성여중ㆍ덕성여고 등의 학교들을 끼고 있어 호텔 같은 '유해시설'이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200m 이내는 호텔을 건축할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호텔 건설의 대표적인 현주소다. 우리나라가 산업화ㆍ정보화로 잘 살게 되고 한류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고 관광시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호텔 건설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일본 도쿄의 외국인 관광객은 840만명, 호텔 객실은 11만2,000실에 달하지만 서울의 경우 1,100만명이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2만7,000실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의 호텔 수준은 400만 외국인 관광객이 쾌적하게 왔다 가는 수준의 객실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호텔 객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급속성장으로 세계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가운데에 놓였고 정치적으로도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동아시아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오피스텔이나 오피스가 호텔로 전환되면서 적잖이 늘고 있다지만 추세를 감안할 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호텔 건립 반대 주장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단순 호텔이 아니라 공연장ㆍ갤러리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3,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관광업계도 호텔을 '유해시설'과 관련시키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 정부도 일단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호텔은 점점 포럼 등 국제적인 행사와 관광ㆍ비즈니스가 진행되는 장소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전시회와 국제회의가 호텔에서 이뤄지고 있고 또 가족단위 휴가를 보내는 데도 호텔이 적극 이용되고 있다. 의식주, 즉 옷가게ㆍ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호텔도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 셈이다. 관광산업, 더 나아가 문화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한데 이것을 기존의 체제와 어떻게 융합시킬지가 문제다. 여행산업뿐만 아니라 전시컨벤션 등에도 필수적인 호텔은 이제 한 사회와 도시를 구성하는 문화요소이자 주체로 봐야 한다.
사실 우리가 가진 호텔에 대한 이미지는 이중적이다. 우선 음습한 풍기문란의 장소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러브호텔' 등 문란한 행위가 벌어지고 교육적ㆍ정서적으로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 관련 법률도 호텔을 유해한 장소로 본다. 지금까지 법률과 규정은 호텔시설을 장려 대상이 아닌 기본적으로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넘어서면서 문제로 제기됐던 호텔부족 문제는 이런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고급호텔에 들어가기는 비용문제로 버겁고 모텔은 꺼림칙한 외래관광객들이 서울에서 밀려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국내에 틈새시장을 노리고 외국계 비즈니스호텔의 상륙이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계 이비스, 미국계 베스트웨스턴, 일본계 도요코인 등이 들어와 성업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급호텔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중저가 '비즈니스급' 호텔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뀐 고급호텔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시컨벤션 행사를 확대해 관광산업에서 보다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에 반해 중저가호텔은 여행객을 위한 저렴하고 편리한 숙소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또 여행자들에게는 이런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호텔들이 여행의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다.
현재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교육청의 승인 없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법률 개정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호텔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를 통해 호텔 투자에 소극적인 민간자본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영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저가호텔과 고급호텔은 각자 나름의 필요가 있고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호텔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수요가 늘어나면서 호텔은 물론 문화공간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 과거 제조업 위주 경제에서처럼 호텔을 근로자의 단순 잠자리로 보거나 때로는 빡빡한 일상사에서 일탈이 가능한 '배출구'로 보는 단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화융성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외래관광객 1,000만명을 넘어 2,000만 시대를 앞두고 관광산업이 우리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에 대한 인식전환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권희석 하나투어 부회장은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 인식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