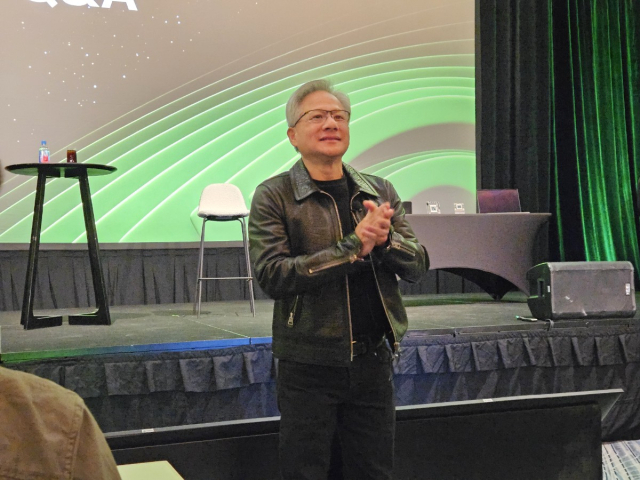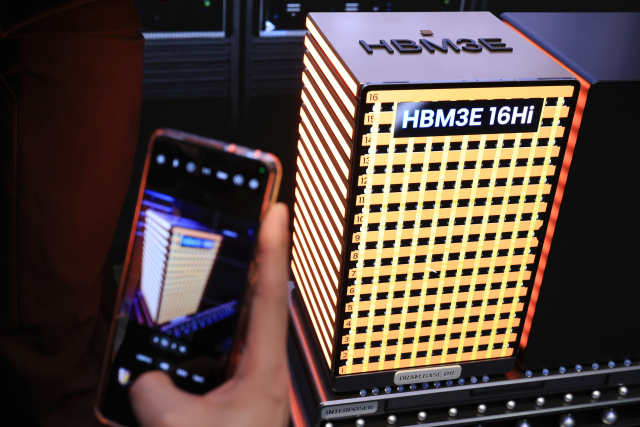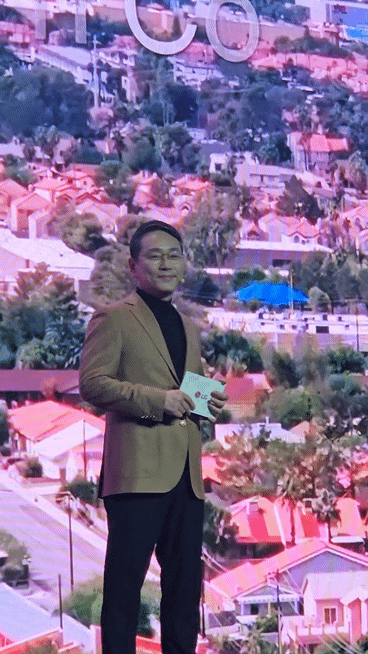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럽 정상들은 보다 ‘큰 정부’로 거듭나 시장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은행 이외의 일반 기업들까지 구제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몇몇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이번 금융위기가 미국식 자유시장주의의 실패를 증명했으며 유럽 전역에 크고 강한 정부가 세워져야한다고 믿게 됐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공적 자금으로 자국 항공사인 알이탈리아를 살려내면서 언론의 칭송을 한몸에 얻고 있다. 그는 파산 위험에 처한 자동차 회사도 구제할 것을 약속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국부펀드 창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비유럽 기업이 위기에 처한 유럽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르코지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EU 국가들의 막대한 금융규제 규모와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중국이나 현금이 풍부한 중동 산유국이라면 국가재정으로 프랑스의 최대 기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에는 그만한 재정이 없다.
둘째,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및 무제한 대출을 허용해줘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파산할 경우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일 뿐이다. 적자가 누적된 항공사를 국가재정으로 살려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알이탈리아를 구제하기 위해 외국의 자본에 기대지 않았다. 대신 반독점법을 고치고 납세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부담을 안겼다. 다른 EU 국가들이 이탈리아의 사례를 본받아 일반 기업들을 구제한다면 이는 유로권 기업들을 거지나 다름없이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경기가 수축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금융을 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통화ㆍ재정정책으로도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이 나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제조업 회사들을 외국 자본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 각 정부는 기업대출에 앞서 유럽위원회(EC)의 허가를 받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독자적인 구제방안은 보호주의를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