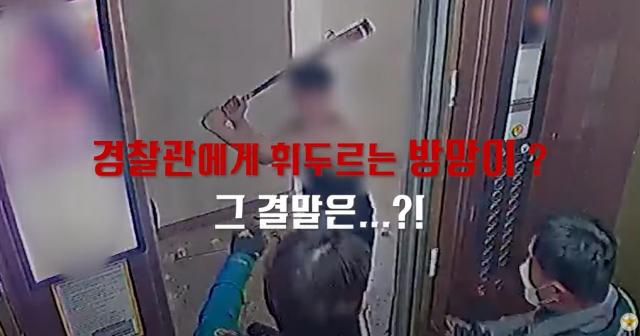허베이 스피릿(HEBEI SPIRIT)호 기름유출사고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고 발생 70여일 만이다. 어려운 때를 당할수록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 미덕이지만 이는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는 물론 그 어느 경우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봉사의 기념비적 기록 달성이다.
생각해보면 지난해 12월7일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 일대 사건이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작은 실수가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 환경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확인시켜줬다.
원인은 간명했다.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너무 컸다. 1,105km에 이르는 해안선과 그에 인접한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다. 이는 잠정적으로 추계된 피해규모가 어장 473개소 5,159ha, 양식어장 368개소 8,571ha, 육상 종묘시설 등 248ha, 기능을 상실한 해수욕장이 20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데서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피해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1만3,000여명에 이르는 도내 어업인이 어로작업에 나서지 못한 지난 몇 개월, 4만5,100여개 해변가의 음식·숙박업체 등이 입은 간접적인 피해, 복원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자연환경의 훼손 등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액이 얼마에 이를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사태는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 지금에야 말이지만 방제작업 초기에는 참으로 망막했다. 너무도 광범위한 피해 현장, 바닷가로부터 일렬로 서서 오염된 기름덩이를 양동이로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다. 마더 테레사(Mother Theresa of Calcutta) 수녀님은 “우리들이 하는 일은 대양 속의 물방물 하나와 같은 일이지만 그 일조차 하지 않으면 물은 아예 말라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이를 실천해내듯 그 작은 양동이로 오염된 바닷물을 모두 퍼내는 역사를 이뤄낸 것이다.
맨 앞에 선 것은 소방당국과 군경이었다.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그들이 있었고 보상을 위한 채증작업까지 앞장서 해줬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단합대회와 송년회를 봉사활동으로 대신한 기업체,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환경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한 분들, 그 하나 하나가 합쳐져 커다란 감동의 물결을 이루고 그 물결이 생명의 파도가 돼 바다를 덮고 있던 검은 죽음의 띠를 걷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 100만이 이뤄낸 결실이다.
물론 모든 방제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해안지역의 모래, 자갈층에 침투된 유류와 암석에 부착된 유류 제거작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돼야 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응급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환경생태계 복원과 함께 지역경제의 복원 등 모든 면에서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항구 복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 모든 것은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물론 사고 당사자, 피해어민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다.
하지만 필자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이라면 이런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태안 사고현장에서 펼쳐진 자원봉사자 100만명 달성을 자축하는 행사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헌신적 노고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자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