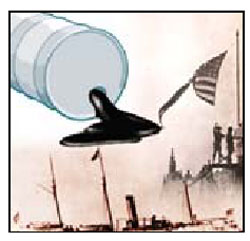홈
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4월9일] 탐피코 사건
입력2008.04.08 17:52:41
수정
2008.04.08 17:52:41
[오늘의 경제소사/4월9일] 탐피코 사건
권홍우 편집위원
멕시코 석유도시 탐피코항에 미군 6명이 발을 들였다. 유류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접안도 하선도 불가능하다’는 계엄 지침에 따라 멕시코군은 미군을 체포했다.
보고를 받은 멕시코군 장성은 미군을 즉각 돌려보냈다. 내정에 간섭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미국에 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914년 4월9일 발생한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고 대형 사건으로 이어졌다.
미군의 항의에 멕시코군은 정중히 사과했으나 미국 정부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담당 장교의 구금과 성조기에 예포 21발을 쏘라고 요구한 것. 멕시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집권한 우에르타 정권은 멕시코의 새 정부를 승인도 하지 않은 미국이 사죄 표시로 예포발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버텼다.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우에르타 정권에 지원할 무기를 적재한 독일 수송선이 최대 항구 베라크루스항에 접근한 것. 당황한 미국은 베라크루스항을 점령해버렸다. 얼마 뒤에는 육군까지 동원해 멕시코를 짓눌렀다.
결국 정권은 전복되고 세계 최대 규모였던 탐피코 유전도 영국의 독점에서 미국과의 양분체제로 넘어갔다. 영국은 불만이었지만 미국의 원조가 절실했던 1차 대전이 한창이라 이권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 똑같이 당한 멕시코와 독일 간의 관계는 더 없이 좋아졌으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멕시코가 빼앗겼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되찾기 위해 독일과 힘을 합쳐 남서부를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대독 선전포고의 숨겨진 배경이었다.
단초를 제공한 탐피코 사건은 오늘날 잊혀져가고 있다. 미군의 침공에 몸을 던져 저항했던 멕시코 사관생도들을 기리는 기념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약자는 언제나 서럽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