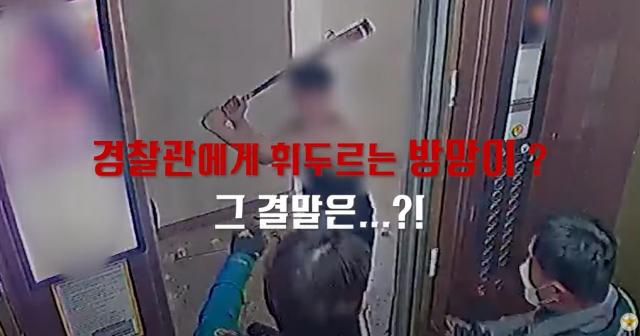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72년 「8·3조치」때 투금사로 출발/94년 종금사 전환/동남아 투자 “자멸”종합금융사의 4반세기 역사가 저물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종금사가 지난 2일 9개사에 이어 10일 5개사가 추가 정업되는 등 절멸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30개에 이르는 종금사의 뿌리는 크게 두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아세아·새한·한국·한외·현대·한불 등 소위 「기존 종금사」로 불리는 6개사. 이들은 73년에서 74년 사이의 1차 석유파동 이후 외환보유액이 바닥나면서 외국 상업은행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50대 50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또다른 갈래는 단자사가 모태인 종금사들이다. 이들은 설립시기에 따라 다시 두부류로 나뉜다. 1972년 「8·3 사채동결령」이 내려지면서 사채를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게 하나. 72년 한국투금(현 하나은행)으로 시작돼 한양·한국·대한·동양·서울·제일·중앙 등이 연이어 탄생했다.
이어 82년에는 이·장 사건이후 신한·삼삼·동아(현 나라종금)·삼희(현 한화종금) 등 4개 투금사가 다시 설립됐다. 투금사의 설립붐은 지방에도 이어져 83년까지 서울 16개, 지방 16개 등 총 32개사로 늘어났다. 이후 지난 91년 한양과 금성투금이 합해 보람은행으로, 한국투금이 하나은행으로 각각 전환했으며, 서울투금 등 5개 투금사는 일은증권 등 증권사로 각각 바뀌었다.
모태가 단자사였음을 반영, 기업에 대한 단자업무에만 치중해왔던 투금사들은 점차 한계점에 봉착했다. 80년대 고금리시절에는 단기자금 운용으로 「황금 캐기」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90년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돼 갔다. 반면 기존 6개 종금사들은 국제금융과 리스 등 업무영역을 다각화해가면서 국제시장에서 신인도를 착실히 쌓아갔다.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던 24개 투금사(은행과 증권전환 8개사 제외)들은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조치와 맞물려 지난 94년 1차로 9개가 종금사로 전환했고 이어 지난해 7월 15개 나머지 투금들도 일제히 종금사로 문패를 바꿔달았다.
오늘날 종금사들의 「비극」은 과거 투금사들로부터 시작됐다는게 정설. 투금사들은 국제금융 경험이 일천함에도 잇달아 동남아 시장에 뛰어들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거액을 물렸고,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잇단 부도에 부실채권이 누적돼 급기야 회복불능 상황에 빠져들며 신인도마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최근 14개 후발종금사들이 잇달아 영업정지당한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