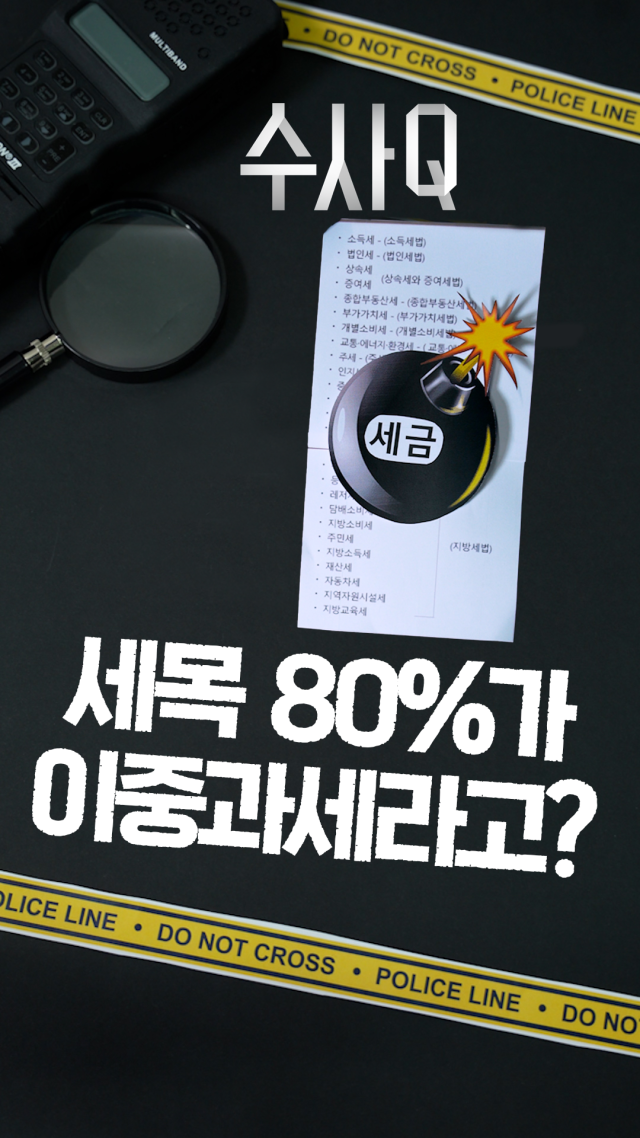청와대가 선호한 배영식 전 의원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민 정용근 전 농협신용대표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인 임 전 실장이 낙점됐다는 것. 전임 신동규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같은 전철을 밝았다. 지난해 신 전 회장 선임 당시에도 권태신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철회 전 캠코 사장(현 서울신문 사장)이 경합한 끝에 결국 제 3 인물론이 힘을 얻으면서 신 전 회장이 어부지리를 얻었다.
임 전 실장은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격인데다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어 농협의 신경분리를 완결한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다. 자기 주장이 유독 강해 각종 구설에 오르내렸던 신 전 회장과 달리 농협의 최대 권력자인 최 회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임 전 실장은 30여년에 걸친 공무원 생활에서 주로 조정자 역할을 맡아왔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국장을 지내 경제정책과 금융전반에 대한 이해가 밝다. 이후 기재부 1차관을 거쳐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실장(장관급)까지 지냈다. 특히 기재부 1차관 시절에는 경제정책을 입안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완만히 조정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에서 출세가도를 달린 임 전 실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금융위원장, KB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보직의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관측이다. 임 전 실장이 넘어야 할 첫번째 산은 무엇보다 최 회장과의 관계 설정이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자리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사이에 끼인 어중간한 자리다.
법상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야 한다. 권한은 적은 반면 책임은 막중하다. 전산마비 등 대형 사건이 터지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 회장과 달리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임 회장이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대표이자 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전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본지 6월5일자 10면 참조
농업경제대표이사에는 이상욱 중앙회 홍보담당 상무가, 상호금용대표는 김정식 교육지원 상무, 조합감사위원장은 김사학 NH농협은행 부행장이 각각 선임됐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