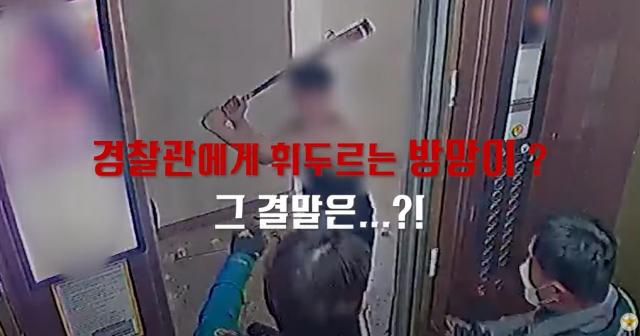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였고, 그 실행방안으로 그해 12월 신문법과 방송법, 세칭 '미디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디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 금지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2009년 7월 입법과정의 대한 절차적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국회를 통과해 입법되기에 이르렀다. 2010년 제야의 날에 방송통신위원회가 4개 법인을 신규 종합편성 PP로, 1개 법인을 신규 보도 전문편성 PP로 승인함으로써, 일련의 작업이 일단락됐다. 콘텐츠 제작 장애 요소 제거를 방송업계에서는 '미디어 빅뱅'으로 표현되는 미디어 시장의 대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미디어 빅뱅 시대에는 플랫폼 위주로 이뤄져왔던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이 콘텐츠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미디어 시장에서의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꺼이 대가를 지출하고자 하는 양질의 콘텐츠 공급이므로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도 따지고 보면 '콘텐츠' 기업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정착되면 또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플랫폼 기업은 지역적인 한계때문이다. 미디어 기업의 핵심 역량은 양질의 콘텐츠 공급에 있고 미디어 기업은 그 성과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미디어 기업 스스로 해결할 몫이다. 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디어 시장이 시장기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가 형성된 성숙한 경쟁적 시장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법은 간단하다. 잠재적 미디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콘텐츠의 제작 여건을 어렵게 하거나 수익원 발굴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요소를 찾아내 폐지 혹은 개선함으로써 미디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최근 방송법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애요소로서 PP 매출액 상한규제, 채널 편성 규제, 광고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사전적 규제 완화의 보완책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시장에서의 콘텐츠 거래 및 경쟁 과정에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금지행위 규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시장의 현실은 이러한 간단한 해법만으로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의 미디어 시장은 성숙한 경쟁적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부가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이유로 마련한 제도에 미디어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적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구조적으로 왜곡된 시장이 형성돼 있다. 미디어 기업들 역시 기존 기업이든 신규 진입자이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이라는 시장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왜곡된 시장구조에 적합한 경쟁수단인 마케팅 경쟁, 광고 수주 경쟁에 더 치중하고 제도를 유리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지대를 추구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 구조적으로 왜곡된 시장에서는 바람직한 미디어 생태계 모델의 자생적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무리 좋은 진흥정책이라도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자유·공정 경쟁 유도책 마련해야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미디어 기업들이 더 이상 제도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본질적인 시장성과에 초점을 둬 창의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인체계를 바꿔줘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방송법은 반성에 기초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