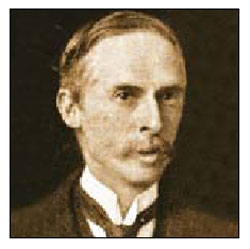|
런던대학교는 그를 강사 명단에서 지워버렸다. 1889년 발표한 ‘산업생리학’에서 ‘저축이 번영의 토대를 침식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미덕으로 여겼던 저축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니! 학계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그를 이단아로 몰아붙였다. 한창인 31세에 강단에서 쫓겨난 홉슨(John Atkinson Hobson)은 1940년 4월1일, 82세로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기고와 사회비평으로 보냈다. 단 한번도 경제학의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그는 20세기 경제학의 흐름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케인스 유효수요이론의 원형이 ‘과소 소비론’에 있다. 홉슨의 진단을 좀 더 살펴보자. ‘가난한 자는 없어서, 부자는 너무 많아 쓰지 못한다. 고전적인 해답은 쓰이지 못한 돈이 저축을 통해 공장과 생산에 투자돼 더 많은 산출을 가져온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해봐야 새로운 소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홉슨은 ‘과소 소비=저축=과잉 생산’이라는 딜레마가 해외투자로 시작되는 금융제국주의로 풀렸다고 봤다. 문제는 결과가 비참했다는 점. 잉여를 바깥에 투자하려는 국가가 하나둘이 아니었기에 제국주의 경쟁이 일고 종국에는 전쟁으로 번졌다. 강단에서 추방된 후 한 신문의 특파원 신분으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돼 새로 발견되는 금광을 둘러싼 자본의 각축전과 보어전쟁을 지켜본 홉슨은 자본 잉여와 저축, 해외투자가 침략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 권의 책 ‘제국주의(1902년)’에 담았다. 레닌이 1916년 펴낸 ‘제국주의론’이 홉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홉슨 사망 68주기, 케인스 경제학과 레닌의 사회주의도 힘을 잃고 있지만 홉슨이 주목했던 금융제국주의의 힘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