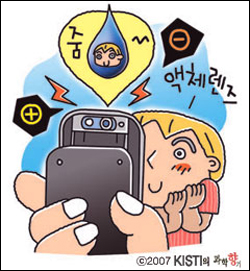홈
산업
산업일반
[KISTI의 과학향기] 물방울로 렌즈 만드는 '일렉트로웨팅'
입력2007.06.20 17:45:19
수정
2007.06.20 17:45:19
유리 대신 액체로 렌즈 초점 맞춰<br>휴대폰 카메라 등에 기술 상용화
휴대전화가 발달하면서 카메라가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휴대전화 카메라의 가장 큰 불편은 줌인, 줌아웃 기능이 없고 거리에 따라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다. 작은 휴대전화 카메라에 렌즈를 여러 개 넣기는 무리인 것.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눈을 보면 수정체는 하나뿐이지만 두께를 조절해 멀고 가까운 물체 모두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즉 딱딱한 유리나 플라스틱 대신 액체로 렌즈를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를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일렉트로웨팅'(Electrowetting) 현상이다.
일렉트로웨팅 현상은 1870년 가브리엘 리프만에 의해 '전기모세관' 현상으로 첫 모습을 보였다. 유리관에 물을 담으면 유리관 벽은 중심부보다 물의 높이가 더 높은데 이는 물과 유리관 벽 사이의 표면장력 때문이다. 그런데 유리관 대신 금속관을 쓰고 전기를 걸면 벽을 따라 올라오는 물의 높이가 더 높아진다. 전기로 표면장력이 더욱 세졌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그러나 1볼트 이하의 낮은 전압에서만 일어났고 이보다 높은 전압을 걸면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돼 버려 100년간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1990년 높은 전압으로도 표면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일렉트로웨팅 현상이 발견됐다. 프랑스 브루노 버지 박사는 금속판을 얇은 절연체로 씌운 뒤 그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다음에 금속판과 물방울에 전기를 걸자 전압이 높아질수록 물방울이 얇게 퍼졌다. 이 방법을 쓰자 수십 V의 높은 전압에서도 물방울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럼 일렉트로웨팅 현상을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 상용화가 가장 빠른 분야는 처음 언급했던 액체렌즈다. 액체렌즈에서는 물과 기름으로 렌즈를 만든다.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일렉트로웨팅 현상으로 변화를 주면 전체 모양이 달라진다. 이를 통해 렌즈의 초점을 5cm부터 무한대까지 맞출 수 있게 된다.
2004년 삼성전기에서 세계최초로 액체렌즈 방식으로 130만 화소의 휴대카메라 모듈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올해 4월에는 선양디엔티에서 200만 화소 제품을 내놓았다. 액체렌즈 방식은 렌즈를 이동시키는 방식보다 6배 이상 전력 소모가 적고 제품의 크기도 작아지는 장점이 있다.
일렉트로웨팅 현상은 오래된 발견을 현대에 맞게 재발굴한 좋은 예다. 앞으로 MEMS 분야와 결합해 무궁무진한 변신을 거듭할 일렉트로웨팅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