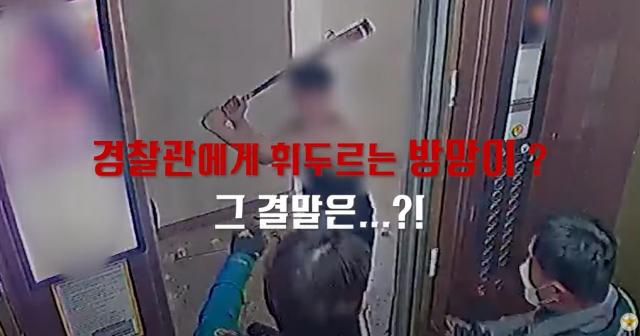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중>제작여건 개선할 길은 없나<br>제작비·대관료 치솟아 "무대 올릴수록 손해"<br>무대장치비 급등하고 대관료가 제작비 절반 차지<br>공공기관서 소극장 임차-재임대 방식도 추진을
‘연극은 춥고 배고픈 일’
제작비, 대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작품 올리는 게 점점 고달파지고 있다. 1~3월 공연한 A작품. 제작비 6,000만 원을 투입했으나 매출은 불과 800만 원. 손실을 크게 입은 극단은 배우, 스탭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애초 약속한 금액 일부를 지불하지 못했다.
극단들의 지갑이 얇아지는데 쓸 돈은 늘어나는 게 문제다. 조명, 무대 장치 등 제작 비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비교적 자금이 풍족한 뮤지컬의 영향이 크다. 용역 업체들이 뮤지컬과 연극을 오가며 연극 제작 환경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대관료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04년 대학로가 문화특별지구로 선정된 이후 건물 임대료가 1.5~2배 가량 올랐다. 임대료 상승은 극장의 대관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현재 하루 평균 대관료는 4년 전보다 10만 원 가량 오른 40만~50만 원 정도다. 제작비 5,000만 원을 들여 2개월 공연할 경우 제작비 절반인 2,500만 원이 대관료로 나간다는 말이다.
연극계는 예상 관객에 비해 제작비용이 너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제작 비용을 줄이고 대관료 문제가 해결돼야 극단의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대세트ㆍ창고 공동운영제 고려해야= 지난 2006년 6월에 공연한 연극 ‘폭풍의 언덕’은 세트 제작비로 250만 원 정도 들었다. 공연이 끝난 뒤 보관 비용이 비싸서 세트는 모두 폐기했다. 11개월 뒤 ‘폭풍의 언덕’은 재공연했고, 제작자는 세트 제작비로 다시 800만 원을 써야 했다.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세트 보관료만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재공연 계획이 확실치 않으면 세트를 폐기할 수 밖에 없다”며 “세트, 소품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운영제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연극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 창고, 관리 인력, 소품 분실ㆍ세트 훼손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만 명확히 마련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명성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극단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공공기관의 소극장 재임대 필요= 대학로 공연장은 2004년 5월 46개에서 현재 107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문화지구 선정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난 공연장은 대관료 인하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코미디물과 뮤지컬의 범람을 낳았다. 오히려 소극장들이 화재에 취약한 지하에 위치한 데다 좁은 통로와 낮은 천장, 불편한 좌석과 화장실, 불완전한 방음 시설 등으로 관객의 불편함과 사고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극계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학로 소극장들을 다수 임차해 합리적 가격으로 대관하면 대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연극인들은 저렴한 대관료에 쾌적한 공연장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 극장을 꼽는다. 아르코 극장의 경우 대극장(608석)은 하루 40만~50만 원, 소극장(132석)은 10만~14만 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극장들보다 30~40% 가량 더 싸기 때문.
문화예술위원회는 이와 관련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아르코 극장, 8월 완공 예정인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등 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공연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공연장을 직접 관리해야 인력,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연극계 시각이다. 올해부터 서울시로부터 위임 받아 운영하는 소공연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