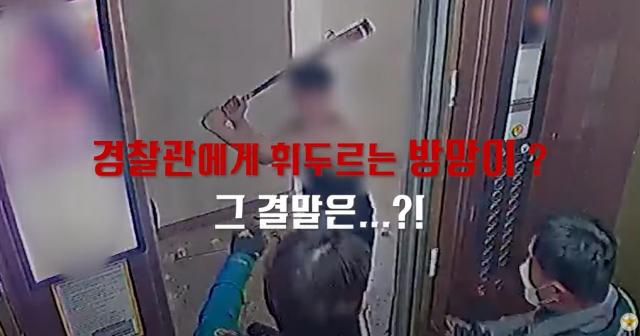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챈 대기업에 피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송사태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중기 측에 단순히 기술을 요구했을 때는 1배수를 배상하면 되지만 기술유용의 경우 '죗값'으로 피해액의 3배수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징벌적 제도는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대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데다 반시장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손해액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393조)과 충돌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묻혀 주목 받지 못해다. 4ㆍ27보선과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대기업에 또 다른 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중소기업 협력관계가 원만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분풀이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 등이 소송을 부추길 수도 있는데다 대기업의 중기 기술 유용에 대한 판단기준도 문제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등 실익보다 소송사태로 인한 대기업과 중기의 갈등 증폭으로 상생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명분으로 계속되고 있는 대기업의 압박이 과연 상생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초과이익공유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등의 경우 상생보다는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자율적인 기업 간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해 징벌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 손해가 발생하면 통상법 절차에 따라 제재 및 배상하도록 하면 될 것을 죗값까지 따져 응징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규모 가격담합과 같은 심각한 불법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거나 보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