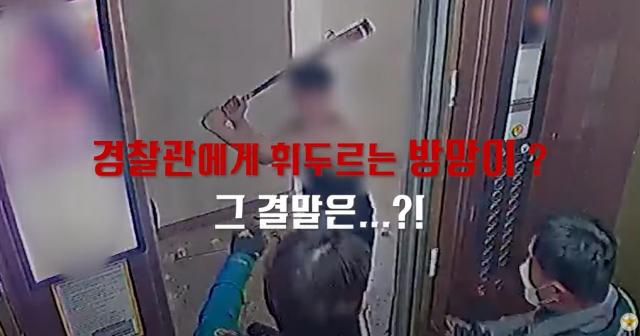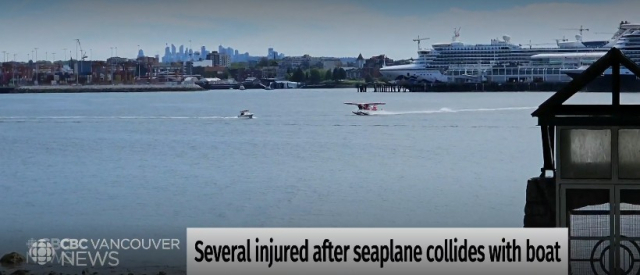서울 시내에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재들이 꽤 많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서울시청 본관 건물은 물론, YS 정권 때 헐린 조선총독부 건물이 대표적이다.
이들 건물 외에도 덕수궁 옆의 서울시의회 건물이나 남대문로의 옛 한전 사옥, 공릉동 옛 서울대 공대 건물 등도 일제 때 지어진 것이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근대문화재등록제도’에 따라 파악된 전국의 근대문화재는 277건이며 이중 서울에 남아 있는 건축물은 44건이다.
이들 문화재들은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사용가치를 유지해왔으나 70년대 이후부터는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해왔다. 역대 정권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나 ‘과거사 청산 운동’의 시범 케이스로 이들 문화재를 국민적 상징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2010년 1,200만 외국관광객 시대를 맞겠다는 민선 4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일제 문화재를 그저 ‘근대 문화재’로 남겨놓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선 서울시의 신청사가 들어설 자리 앞을 흉물스럽게 메우고 있는 서울시청 본관 건물을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를 현재의 자리가 아닌 뚝섬 시민의 숲 근처나 구로구의 어느 공단 주변에 옮겨 일본인들을 위한 호텔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향수가 많은 일본인들이 이 건물 앞에서 마음껏 사진을 찍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가세한다면 이 호텔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 천안 독립기념관 모퉁이에 보관 중인 조선총독부 건물도 이곳으로 옮겨와 대규모 ‘일제 문화재 호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 중 제1위다. 지난해의 경우 약 600만명의 외국 관광객 중 일본인이 250만명을 넘어 여전히 최대 규모를 차지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최근 크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일본인에 비하면 4분의1이 안된다. 서울시는 1,200만명 관광객 시대가 중국인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 관광객을 빼고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