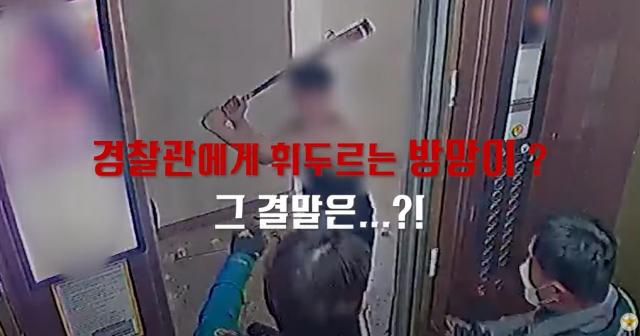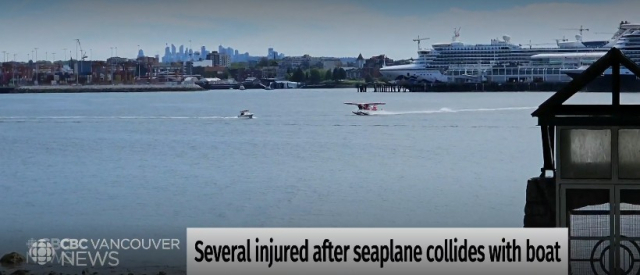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 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속엔 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A는 지금도 지난해의 일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그동안도 힘들게 다니고 있던 직장이지만 아무래도 더 이상은 여러 사정으로 다닐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래저래 고민하던 끝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유력자 모 씨를 찾았다.
노후·자식 걱정에 불안감 커져
"직장을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괜찮은 곳 없을까요." 힘들게 말을 꺼냈다. 사실상 청탁이었다. 자신의 문제를 두고 그동안 이런 청탁을 해 본 적이 없어 정말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모 씨의 답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침묵의 시간은 짧았지만 A에게 그 시간은 마치 며칠 흐른 듯 싶었다.
그보다 며칠 전 A는 아들을 불렀다.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다. "국립대학 쪽으로 진학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직장생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솔직히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다. 엄마 아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아들에게 있는 현실은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큰 맘 먹고 얘기했다. 하지만 말을 하고 난 뒤 후회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런 말까지 했어야 하나…."
B는 잘 나가는 공무원이다. 동기들은 승진을 앞두고 눈치작전이 치열한데 그는 뜻밖의 결정을 했다. 해외근무를 자청한 것이다. 어느 공무원이 승진을 싫어할까. 그러나 그는 아들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
몇년 전 일이다. 아침에 아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데 교복이 없었다. "교복이 어디 있느냐"고 엄마가 물어도 아들은 묵묵부답. 결국 세탁기 앞 빨래감을 쌓아둔 곳에서 발견한 교복은 옷 뒤편이 온통 잉크로 뒤범벅이 돼 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귀국한 아들이 한국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못했고 그 와중에 왕따가 된 아들을 상대로 같은 반 아이들이 교복에 잉크를 일부러 쏟았던 것. 이후로 아들은 말이 없어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학교 담임이 부모를 불렀다. "아이가 이상해요. 같은 반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예요." 그 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A는 부랴부랴 아들을 다른 학교로 옮겼다. 하지만 쉽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지금도 A는 아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다.
해외근무는 A가 아들을 위해 택한 마지막 선택. 아들이 어렸을 때 공부한 곳으로 가면 상황이 호전될까 하는 바램이다.
C는 최근 직장을 옮겼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기관과 비슷한 곳으로.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 "이번에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는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 가는 곳마다 오래 있고 싶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직장 서열 뒤바뀌는 설움도
한번은 해외근무를 했다. 가족까지 모두 떼어 놓고 혼자서 갔다. 열심히 했다. 해외유학 경험도 있고 해서 체질에도 맞는 듯 싶었다. 현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장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귀국하라고. 아무런 사전 연락도 귀뜸도 없었다. 더욱이 함께 있던 사람은 남고 자기만 들어오란다. 들어와서는 구체적인 역할도 없이 이름뿐인 자리를 받았다. 나가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만두고 직장을 옮겼다. 자신의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열심히 뛰었다. 하지만 얼마 뒤 사장이 젊은 사장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사장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장 군단'을 왕창 몰고 들어왔다. 이들이 임원으로 들어오면서 핵심 라인을 맡았다. 그러고 보니 대학 후배가 C의 직속 상관으로 들어왔다. 후배가 눈치를 줬다. 나가줬으면 하고.
오십 즈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