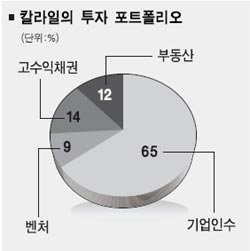|
|
|
|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윌리엄 콘웨이, 다니엘 다니엘로 등 3명의 공동창업자는 지난 87년 칼라일을 설립한 후 30년 가까이 트로이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빈틈없는 분업체제를 유지하며 그야말로 찰떡 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칼라일이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 회사로 떠오른 것도 이들의 완벽한 팀워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루빈스타인은 워싱턴 정가에 구축해 놓은 폭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칼라일을 대표하고 있다. 그는 지난 77년 27세의 나이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 부보좌관으로 발탁된 후 4년간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백악관에 근무할 당시부터 구축한 인맥은 칼라일을 키우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콘웨이는 칼라일의 설계사로 불린다. 굵직한 투자 결정 가운데 콘웨이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그는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투자결정 및 펀드 운영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다니엘로는 살림꾼이다. 루빈스타인이나 콘웨이가 대외적인 업무나 투자현안에 매달리는 동안 다니엘로는 칼라일의 일상적인 경영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50대 중반이다. 따라서 후계 구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PEF 시장 현황을 고려할 때 후계자 육성 및 발굴은 시급한 현안이다. PEF 시장은 나날이 급성장하고 있다. PEF가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자 연기금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이 앞 다투어 돈을 들고 찾아온다. 칼라일이 지난해 9월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한 ‘칼라일 파트너스 4호’의 경우 펀드 규모가 65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사모펀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펀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면 소수의 경영진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보통 펀드 운영기간이 10년 내외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 펀드를 운영하는 데도 힘에 부친다. 칼라일이 지난 2003년 루이 거스너 전 IBM 회장을 영입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거스너는 칼라일 그룹 회장으로서 시장 상황 급변에도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하는 동시에 차세대 지도자 육성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