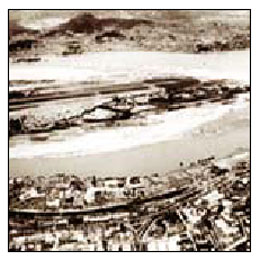|
사대문과 신촌ㆍ돈암동ㆍ장충동. 1960년대 중반까지 서울의 실질적인 생활권이다. 1963년 강남권 일대가 대거 서울에 편입됐으나 일제가 건설한 한강철교와 인도교가 연결해주는 노량진과 영등포 부근만 수도권일 뿐 대부분 논밭에 머물렀다. 해마다 여름이면 장마가 자연제방을 넘어 연례적으로 물난리도 겪었다. 한국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여의도의 사정도 마찬가지. 파월 국군장병의 면회소가 설치된 여의도 비행장(지금의 여의도 광장)에 가려면 나룻배로 건너야 했다. 살만한 땅과 집은 많지 않고 인구는 계속 밀려들어와 변두리 산꼭대기까지 판자촌으로 덮여가던 1967년 9월22일, 서울시가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골자는 고층 신도시로서 여의도 개발과 총연장 74㎞의 강변도로 건설. 국가예산의 23%에 해당되는 462억6,4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한다는 서울시의 청사진은 거창한 것이었으나 당초 여의도 개발을 의뢰받았던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20년 계획, 공사비 1,000억원 투입 방안보다는 규모가 작아졌다. 강남북 강변도로망의 완공도 5공 정권에서야 이뤄졌다. 한강 개발은 서울의 본격적인 팽창과 강남 부동산 신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청약열풍으로 시작된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강변도로 건설과정에서 생긴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된 동부이촌동과 반포ㆍ잠실로 번져나갔다. 동일계 진학 허용으로 명문대 합격률이 높았던 여의도의 교육열기도 고스란히 강남으로 옮겨졌다. 매립지를 불하받은 재벌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개발에서는 누가 돈을 벌까. 초기 한강 개발을 기획했던 건축가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자연친화적 개발이 이뤄지고 시민들의 강변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