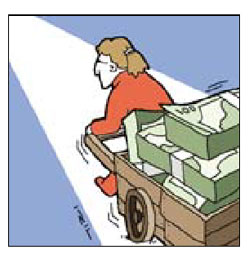|
독립 직후 미국에 위기가 찾아왔다. 돈이 없어서다. 연방은 물론 각주도 빚 독촉에 시달렸다. 독립전쟁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된 공채와 차용증서의 합계액이 약 7,600만달러. 연방 재정규모의 14배에 달했다. 해결방안을 둘러싼 갑론을박 속에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골자는 차환 발행. 연방이 모든 부채를 떠안겠다는 방안에 즉각 반발이 따랐다. 반대론자들은 연방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질 우려가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재정을 운용하거나 빚을 갚은 주보다 부채를 많이 지고도 덜 갚은 주들이 유리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최대 쟁점은 투기 논쟁. 애국심과 애향심으로 독립전쟁 채권을 주로 매입한 농민들 가운데 끝까지 보유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서 액면가격의 25%로 채권을 사들였던 동북부 투기세력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두고두고 해밀턴의 발목을 잡았다. 당파 싸움도 더욱 심해졌다. 결론은 해밀턴의 승리. 독립채권의 원소유자와 유통시장에서 사들인 투기세력을 구분할 수 없으며 악성채권의 차환을 미루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제적 신용까지 떨어진다는 설득과 ‘거래’ 덕분이다. 해밀턴은 반대론의 좌장격인 토머스 제퍼슨에게 연방 수도를 뉴욕 대신 남부에 가까운 포토맥강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을 걸어 양보를 얻어냈다. 1790년 7월26일 의회를 통과한 ‘공공채무 상환법’은 신생 미국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연방정부의 지도력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월스트리트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 차환발행을 통해 75%라는 차익을 거둔 ‘투기자금’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정적이었던 해밀턴과 제퍼슨의 타협과 양보 속에서 신생 미국이 위기를 넘기고 경제성장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