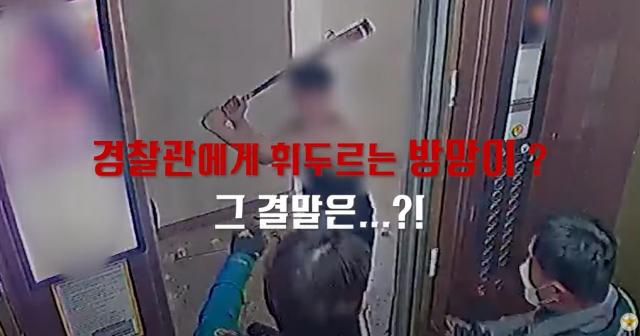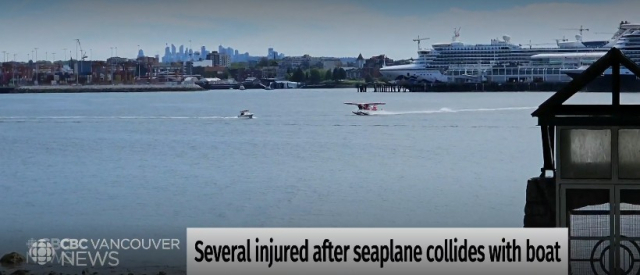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그냥 차라리 안 팔고 말래요.”
지난 8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100㎡ 이하의 모든 식당까지 확대된 후 찾은 서울시내 한 분식점 주인의 하소연이다. 최근 정부의 원산지 표시제 강화방침에 따라 김밥ㆍ라면 등을 파는 이 분식점 역시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쇠고기김밥’과 ‘불고기덮밥’ 등 쇠고기가 재료로 쓰이는 메뉴들은 아예 메뉴판에서 지워버리고 팔지 않을 계획이다.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사올 때 원산지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수시로 메뉴판을 새로 고쳐써야 하는 것도 무리인데다 정육점에서 파는 쇠고기의 원산지 역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새는 ‘쇠고기김밥’처럼 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은 손님들이 아예 찾지도 않는데 굳이 음식점 주인조차 믿지 못하는 원산지를 표시해 팔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보태졌다.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비롯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원산지 표시 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선 음식점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물론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의 음식점 주인들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정부가 성난 ‘쇠고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너무 서둘러 제도를 밀어붙이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론에 떠밀려 관련 부처 간 사전 조율 없이 성급히 법 개정을 추진하다 보니 단속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상으로는 100㎡ 이상의 음식점만 단속대상이 되지만 최근 개정된 농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 주체에 따라 상이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또 100㎡ 이하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단속보다 계도위주의 활동을 펼친다고 하지만 과연 3개월 동안 60만개가 넘는 전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홍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대대적인 단속 및 홍보인력의 확충이 절실한 이유다.
모든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단속이 본격 시행되는 10월까지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80여일 동안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관련 법규의 보완 및 인력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국민들의 먹거리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