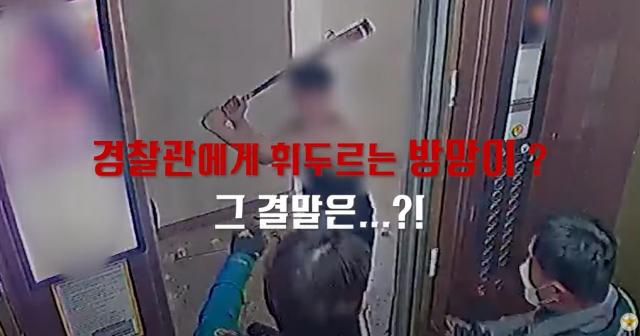요즘 약 값 거품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수차례 진통 끝에 다국적제약사 비엠에스(BMS)가 시판하는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가격이 결정됐다.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에이즈(AIDS) 치료제 ‘푸제온’은 지난 2004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약가 협상이 지지부진해 해당 제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신약의 경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고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반면 환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폭리를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약 값에 거품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을 해왔고 최근에는 강제 실시, 원가 공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강제 실시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허를 획득한 의약품을 다른 사람이 취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2003년 특허청이 ‘전염성 같은 급박한 국가ㆍ사회적 위험 사례가 적다’며 기각한 전례로 봤을 때 ‘스프라이셀’ 강제 실시도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원가 공개는 현실성이 있을까. 다국적제약사들은 원산지가 미국ㆍ유럽ㆍ인도ㆍ중국 등이니 그만큼 원가도 다양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 그만이다. 각국마다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내 제약사만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역차별이다. 원가를 공개하면 다국적제약사의 약 값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순박한 것 같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2006년 5월 새로운 약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단계적으로 강행 중이다. 이전까지는 서방선진7개국(G7) 평균가를 적용했으나 지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및 약가 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이라는 이중 규제과정을 거쳐 신약이나 개량신약(신약의 일부 부속성분을 바꿔 만든 약)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힘없는 국내 제약업계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전에는 연구개발(R&D) 결과물인 개량신약의 등재가 쉬웠으나 제도시행 이후 다국적제약사의 신약에 비해 등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신약의 경우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지만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은 대체제가 있어 제대로 된 약 값을 받기 힘들고 등재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개량신약을 징검다리 삼아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의 개량신약 육성책이 없으면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의약품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수입해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선택의 격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첫째, 약 값 거품 논란 중에도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을 대체할 개량신약을 조기 개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해왔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 방지 및 생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생산원가 등을 지원해 항상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의 경우 다국적제약사들은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생산을 기피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묵묵히 생산, 공급해오고 있다.
둘째, 제약산업은 무기산업에 버금가는 생명안보산업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국가위기 상황에 국내 제약 생산기반이 없으면 강제 실시가 불가능하다. 다국적제약사를 보유한 신약 선진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예속된다. 셋째,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IT)에 이은 성장동력산업으로 보건의료ㆍ식량ㆍ에너지ㆍ환경 등의 난제를 해결할 생명공학기술(BT)을 적극 육성 중인데 제약산업은 BT 분야의 60~70%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건강보험ㆍ환자ㆍ제약산업을 함께 고려한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