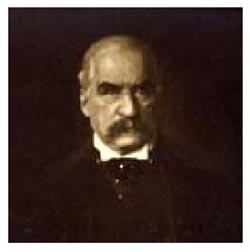|
세계 예술품 시장이 요동쳤다. 모건(J P Morgan)이 이집트 여행 도중 쓰러졌다는 소식 때문이다. 수집광인 그가 사망하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모건은 1913년 3월31일 숨을 거뒀다. 모건이 최후를 맞았던 로마의 그랜드호텔에는 교황을 비롯해 각국 국가원수와 정치인ㆍ예술가들이 보낸 조전(弔電) 3,698통이 쌓였다. 역사상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대접이다. 남긴 유산은 6,830만달러. 요즘 가치 61억달러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지만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치고는 많지 않다며 뜻밖으로 여겼다. 록펠러는 “단지 부자라는 단어로는 모건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자 이상의 부자라는 뜻이다. 우량기업만 골라 상대하며 철강과 철도, 해운, 농기구 제작업체들의 인수합병을 주도해 최고 은행가로 명성을 쌓았던 모건이 절정을 맞았던 시기는 1893년과 1907년.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하고 주요 투자은행(증권사)들이 도산하며 위기를 맞을 때마다 모건은 자금을 무제한 대출, 위기를 잠재웠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행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모건의 생애는 미국 중앙은행의 공백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중앙은행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던 제2합중국은행이 없어진 1837년 태어나 연방준비제도가 생긴 1913년 죽었으니까. 모건은 별명인 ‘금융황제’처럼 군림했다. 협상을 중재할 때는 결말이 나올 때까지 양측을 감금한 적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결혼 4개월 만에 폐결핵으로 죽은 첫 아내를 잊지 못해 미술품 수집에 빠져들고 다양한 여성과 만났다. 대중의 존경도 받지 못했다. 록펠러나 카네기와 달리 기부에 인색했던데다 남북전쟁 참전을 기피해 평생 ‘병역기피자’라는 비난과 질시 속에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