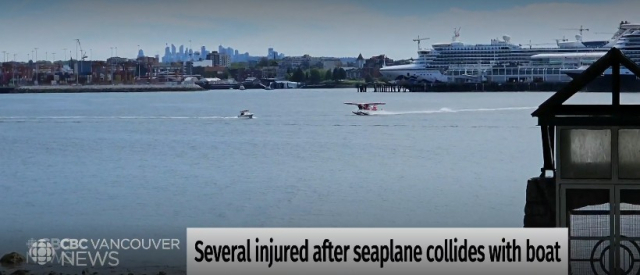지난해 말 어느 모임에서 중진 국회의원 한분이 우스갯소리로 던진 한마디가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뉴질랜드인가 어느 나라의 TV에서 와이셔츠 광고를 하는데 카피가 '한국 국회위원들이 입어도 찢어지지 않는 와이셔츠'라는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볼 수 없지만 자조적인 그의 제스처에 비춰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한국 정치가 망신살이 뻗친 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우리 국회가 국민의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라 해도 외국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화나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이처럼 능멸 당하고 비아냥거리가 된다 해도 할말은 없어 보인다.
국가 이미지 망가뜨리는 국회
특히 이번 18대 국회는 사상 최악으로 평가된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을 비롯해 나쁜 기록은 거의 모두 갈아치웠다. 당사자들이야 나름대로 할말이 있겠지만 허구한날 싸움박질과 극한투쟁이 상습화된 가운데 폭력이 난무하는 격투기장의 이미지로 각인됐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당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것 자체는 정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다. 의회정치의 본산인 영국 의사당은 여야가 서로 마주보고 않도록 설계돼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양쪽에서 칼을 뽑았을 때 서로 닿지 않는 정도의 간격을 뒀다는 것이다. 정치라는 행위에 내재된 격렬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현재 다투고 있는 사안들이 과연 국회가 일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극한 대결과 폭력으로 얼룩져야 할 정도로 중대사들인가 하는 점이다. 가령 대립과 갈등의 불씨로 지목되는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등에서만 이기면 다른 모든 일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안 심의를 각자 제 밥그릇만 챙기고 얼렁뚱땅 해치우는 것이 훨씬 부도덕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회무용론'과 같은 극단적인 불신이 생기는 것은 경제위기로 깊어지는 국민의 시름과 고통,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는 청년들의 아픔 등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2010년을 맞아 각 부문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다. 국운 상승의 전기로 삼자는 의욕도 보인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지각변동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주요7개국(G7)을 중심으로 10억명 정도에 의해 주도돼온 세계경제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40억명이라는 거대인구가 참여하는 G20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970~1980년대 세계경제의 황금기를 잘 활용해 선진국 문턱까지 왔듯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의 여부는 이 같은 새로운 물결을 얼마나 잘 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명감 발휘해 권위 찾아야
서글픈 것은 선진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국민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가 개혁대상 1순위로 꼽힌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으로서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입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국운 상승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절망하게 하는 온갖 부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다수 국민이 분개하고 대통령까지 질책하고 나선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와 같은 황당한 일도 국회가 나서면 당장 고칠 수 있다. 우리보다 몇 배나 잘사는 나라에서조차 볼 수 없는 낭비와 사치만 막아도 국민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관심은 이미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길게 봐야 2년 후 있을 대선에 가 있는 듯하다.
'정치인의 시간지평은 차기 선거를 넘지 못한다'는 어느 학자의 지적이 생각난다. '3류 정치'를 넘지 않고서는 국운이 뻗어나가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