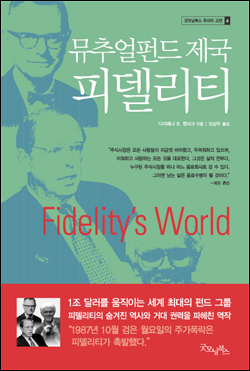뮤추얼펀드 제국 피델리티<br>다이애나 B.헨리크 지음. 굿모닝 북스 펴냄<br>'보스턴 부호 재산 관리' 소규모 회사로 출발<br>'펀드매니저'개념 도입후 최대 펀드그룹 등극
 | | 오늘의 피델리티를 만든 주인공들. 에드워드 존슨 2세, 에드워드 존슨 3세, 피터 린치(위쪽부터 시계방향) |
|
1조5,545억 달러. 세계최대의 펀드 그룹 피델리티의 자산 규모다.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1,488조원.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731조원)의 두배를 넘는 돈을 지닌 피델리티의 움직임은 월스트리트의 흐름을 좌우한다. 뉴욕증시 역사상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1987년의 주가대폭락도 피델리티의 주식매도에서 비롯됐다는 논란이 일 정도다.
피델리티는 어떻게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게 됐을까. 신간 ‘뮤추얼펀드 제국 피델리티’에서 답이 있다. 30년 경력의 금융탐사보도 전문기자인 다이아나 B. 헨리크는 피델리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미국 뮤추얼펀드의 생성과 발전, 기업 사냥, 규제를 둘러싼 증권감독당국과의 줄다리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저자는 ‘보스턴 문화’에 주목한다. 금융재산의 옹호를 종교적 신념과 동일하게 여겼던 보스턴의 재산가들은 스스로 ‘브라민’이라 부르며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의 부호들과 구분했다. 브라민은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에서 따온 용어. 졸부를 경멸하면서도 부의 축적에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보스턴 기질에서 피델리티가 싹텄다.
창업자인 에드워드 존슨 2세도 브라민 출신. 변호사로서 로펌과 뮤추얼펀드 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시장을 익힌 그는 1944년 작고 보수적인 펀드를 인수했다. 자산규모 500만 달러짜리 피델리티 펀드였다. 처음 영업대상은 가족과 친지. 보스턴 부호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소규모 펀드는 곧 공격적인 영업으로 돌아섰다.
이전 직장으로부터 ‘배신’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고객을 흡수한 창립자 곧 에드는 시장의 선두로 올라섰다. 비결은 스타 시스템. 투자 결정을 위원회가 맡던 종전과 달리 한 사람에게 맡기는 구조였다. 에드는 ‘바이올린은 두 사람이 켤 수 없다’며 펀드메니저 개념을 도입했다.
거대회사로 컸지만 피델리티의 속은 보스턴 기질을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전설적인 펀드메니저로 이름을 날렸던 제럴드 차이 등 후계를 기대했던 스타들은 에드의 아들, 네드 존슨의 대권 승계를 보며 회사를 떠났다.
네드 존슨은 개개인의 자율을 중시했던 부친과 달리 회사를 직능별 그룹 중심으로 바꾸었다. 누적 수익률 2,703%를 기록해 피델리티가 배출한 최고의 펀드메니저라는 평가를 받았던 피터 린치 신화의 실상도 치밀한 홍보전략 때문이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보스턴 귀족, 즉 ‘브라민 중심의 가족회사’라는 틀과 성장세는 계속 이어져 네드 존슨의 장녀인 애비게일 존슨이 경영권을 승계한 후에도 1위를 내달리고 있다. 저자가 ‘19세기말 악덕자본 시대 이래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한 적은 없었다’고 말할 만큼 피델리티 제국내 브라민의 전통은 확고하다.
피델리티를 비롯해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운용자산은 9조3,770억달러. 미국 증시의 23%를 차지한다. 한국 뮤추얼펀드(12조430억원)의 비중 6.5%보다 훨씬 높다. 거꾸로 그만큼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미국 뮤출얼 펀드 60년이 걸어온 길은 출범 8년 남짓한 한국 자산운용시장의 앞길을 가늠하는 망원경 격이다. 605쪽, 값 2만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