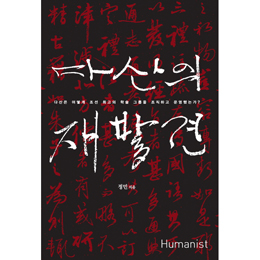홈
문화·스포츠
문화
[책과세상] 5년간 발로 뛰며 찾은 다산 정약용 재조명
입력2011.08.26 17:03:50
수정
2011.08.26 17:03:50
■ 다산의 재발견 (정민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다산 정약용(1762~1836)은 1801년 전남 강진으로 귀양살이를 떠나 17년 만인 1818년 여유당으로 돌아왔다. 다산 개인에게는 불행이었을지 모르나 조선 학계에는 이 시기가 축복의 시간이었다. 다산은 강진에서 훗날 다산학단(茶山學團)으로 성장한 제자들을 양성했고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완성했다.
저자인 정민 한양대 교수는 지난 5년간 다산의 행적에 심취했다. 다산에 관한 자료를 찾아 방방곡곡을 뒤진 그는 문집 뿐아니라 다산의 친필편지까지 샅샅이 살펴 거장을 재조명했다.
조선에서 문집을 편찬할 때 편지글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는 편집 작업을 거친다. 때문에 편지 내용 외에 글을 쓰는 사연과 쓴 날짜 등은 삭제된 뒤 문집에 실린다. 저자가 새로 발굴한 다산의 친필 편지 150여 통은 현존하는 문집에는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 다산이 제자 이강회의 이름으로 추사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는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이 편지는 다산학 연구자인 김영호 씨가 1970년대 충남 예산의 추사 고택에서 추사 5대손에게서 구해 소장한 자료이다. 52세의 다산이 1813년 유배지인 강진 다산초당에서 당시 27세의 젊은 추사에게 보낸 편지다. “운곡(雲谷)의 야인 이강회가…(중략) 글을 드립니다. 족하(추사 김정희)와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것은 시골 어린아이나 들늙은이가 조세(租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향관을 칭송하고 이정(里正)은 욕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인하여 족하께서도 작별한 뒤로 건강하신지 문안을 드립니다.(하략) ”
저자는 이 편지의 필적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산이 직접 붓으로 쓴 친필임을 확신했다. 그런데 다산은 왜 굳이 제자의 이름을 빌려 추사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아무래도 편지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추측한다. 편지에는 ‘상서평’이나 ‘독역요지’, ‘괄례표’ 같은 민감한 해석을 담은 자신의 저술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파란이 일 것을 우려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아니나 다를까 편지 말미에는 “예(禮)는 대답이 없을 수 없는지라, 선생님(다산)께서 육경에 대해 논하신 글 각각 몇 조목을 여기에 적어 보냅니다. 바라옵기는 다만 남의 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즉시 화롯불에 넣어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처럼 책은 기존의 다산 연구에서는 접하기 힘든 다산의 속내를 보여준다. 다산초당의 원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 ‘다산도(茶山圖)’나 성리학자였음에도 승려인 혜장ㆍ초의와 교류하며 쓴 글, 딸을 위해 그린 ‘매조도(梅鳥圖)’ 등 다양한 자료가 수록돼 있다. 4만3,000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