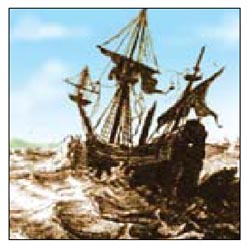|
‘배가 바다 가운데서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인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조선왕조실록 효종 4년(1653년) 8월6일자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소속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난파한 하멜 일행과 조선 관리 간 문답. ‘어디로 가고 있었나?’ ‘낭가삭기(郞可朔其ㆍ나가사키)입니다. 제발 저희를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작 하멜 일행은 13년이 지나서야 조선 땅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한양 압송과 전라도에서의 억류 끝에 탈출을 통해서다. 일본을 거쳐 1668년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란선 제주도난파기’를 펴냈다. 하멜의 표류기는 영어와 불어ㆍ독일어로 번역되며 유럽 사회에 조선을 처음으로 알렸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조선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반면 조선에서 탈출한 후 나가사키에서 조사 받는 과정은 일본인들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하멜 표류기는 유럽인들에게 ‘조선은 일본보다 한 수 아래의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하멜 표류기가 나온 뒤인 1670년, VOC는 조선과의 직접 통상을 추진하기 위해 1,000톤급 상선 ‘코레아호’를 건조하고 인도네시아 식민지로 보냈다. 여차하면 제주도까지 점령할 심산이었다. 조선과의 직교역은 물론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다. VOC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조선과 직교역할 경우 네덜란드와의 관계를 모두 끊겠다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탓이다. 조선을 향해 항진하던 코레아호도 뱃머리를 돌렸다. 만약 조선이 17세기 후반 네덜란드를 통해 서양문물과 접할 수 있었다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하멜 표류 355주년, 우리는 외부환경에 능동적ㆍ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