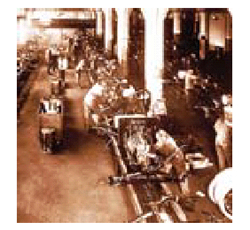|
1913년 12월1일, 미국 미시간주 포드자동차 디어본 공장. 작업대가 모두 사라졌다. 대신 들어선 게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쏟아내는 부품을 단순 가공하자 효율이 높아졌다. 당장 T형 승용차 1대당 조립시간이 5시간50분에서 1시간 38분으로 줄어들었다. 생산량도 1910년 1만9,000대에서 1914년 27만대로 늘어났다. 생산단가도 내려가 825달러였던 차 가격이 260달러까지 떨어졌다. 포드시스템의 탄생 배경은 끊임없는 혁신 노력과 미국식 합리주의. 1903년 회사설립 당시부터 포드는 공구와 부품을 규격화하고 공정을 단순화시켜 경쟁업체의 절반 가격에 차를 내놓았다. 1907년에는 공장의 경사면을 따라 4층 차체 제작, 3층 바퀴 부착과 도장, 2층 세부 조립, 1층 최종 검사로 이어지는 연속공정을 선보였다. 이동식 작업 라인 아이디어는 도축장에서 나왔다. 노동자가 움직이는 대신 고깃덩어리가 천장에 설치된 모노레일에 매달려 작업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자동차 제작에 응용한 것이다. 단순반복 노동이 노동자의 생산의욕과 창의성을 깎아먹고 작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부작용 속에서도 포드시스템은 대량생산ㆍ대중소비 시대를 열었다.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것도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덕분이다. 요즘도 대부분의 공장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동식 생산 라인의 등장을 ‘제2의 산업혁명’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래사회를 풍자적으로 묘사한 공상과학소설 ‘멋진 신세계’에서는 연도 기준을 AD 대신 ‘AF(after Ford)’로 표시한다. 포드의 대량생산 시스템이 산업사회를 만들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