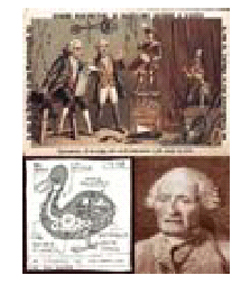|
1739년 프랑스 루이 15세의 궁정. 헤엄을 치고 날개를 퍼덕거리며 목을 빼 물과 먹이를 먹던 오리가 배설했을 때 박수가 터졌다. 부품 400개로 만들어진 기계였기 때문이다. 기계 오리 제작자 보캉송(Jacques de Vaucanson)은 타고난 장인이었다. 코흘리개 시절, 교회 시계를 보고 똑같이 작동되는 모조품을 만든 적도 있다. 장갑 제조업자의 10남매 중 막내로 1709년 태어난 보캉송은 일곱살 때 부친을 여읜 뒤 수도원에 들어가 수학을 익혔다. 신학보다 역학과 해부학ㆍ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스무살 무렵 수도원에서 나와 파리에서 각종 극장용 악기와 인형을 만들었다. 최초의 자동인형은 1738년 선보인 ‘플루트 연주자’. 태엽에 감긴 기계음이 아니라 손가락과 입술, 들숨과 날숨을 이용해 12곡을 연주하는 인형은 대성공을 거뒀다. 노동자의 일주일분 임금에 해당되는 3리브르씩의 관람료를 받은 그는 돈방석에 앉았다. 작동 비결은 높이 1.4m짜리 받침대. 인간의 모든 근육에 해당되는 장치를 집어넣었다. 관람객이 적어지자 그는 두 가지 신제품 ‘북 치는 사람’과 ‘기계 오리’를 내놓았다. 명성을 얻은 보캉송은 1741년 국영 비단공장의 감독관 자리까지 따냈다. 자동화의 대상을 인형에서 공장으로 바꾼 그는 1745년 새 직조기를 발명하고 공정을 자동화시켰다. 프랑스가 영국보다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아크라이트의 수력방적기가 등장(1771년)하기 26년 전에 보캉송의 자동직조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절. 직조기는 실직을 우려한 기술자들이 불태워버렸다. 보캉송은 1782년 11월20일 사망할 때까지 ‘새 기계를 발명하면 보복하겠다’는 위협 속에 살았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