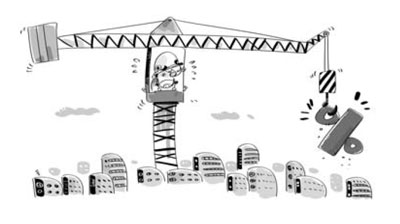홈
국제
국제일반
"중도금 무이자 대출부담 눈덩이, 주택거래 숨통이라도 터줬으면"
입력2010.03.03 17:36:13
수정
2010.03.03 17:36:13
[건설업계 5월위기설 고조] 건설업체 하소연<br>
"분양 잘됐으니 걱정 없을거라고 부러워하더군요.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어렵게 전화로 인터뷰에 응해준 한 중견 건설사인 A사 K부사장의 첫마디였다.
A사는 지난해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높은 계약률로 경쟁사들의 부러움을 샀던 업체다. 계약률이 90%를 넘어 아직도 미분양으로 고전 중인 주변 업체들과 대비됐다.
하지만 K 부사장은 요즘 시장 상황을 바라보며 좌불안석이다.
"비인기지역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계약금 10% 외에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융자로 지원해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가구당 3,000만~5,000만원 할인해줬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높은 계약률은 '출혈 마케팅'의 결과라는 것이다.
K 부사장의 진짜 걱정은 1년여 앞으로 예정된 입주시점이다. "계약자의 상당수가 유주택자였어요. 양도세도 감면되고 분양조건도 좋으니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는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새 집에 들어오려면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대출규제에 꽁꽁 묶여 집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입주시점에서는 결국 중도금 대출을 일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강화로 입주예정자는 상당 금액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 공정이 진척될수록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이자비용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금융권의 대출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입주자가 물 이자비용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에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웬만한 대형업체에 시공을 맡긴다 해도 입지가 조금만 떨어져도 은행권 PF 대출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K 부사장은 "중견ㆍ중소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을 찾아 대출이자가 연 12%가 넘는 돈을 조달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이후 업체들의 수익률은 5% 남짓한데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한 시행사는 결국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시공사에 사업권을 모두 넘겨주고 손을 떼고 말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요즘 동종 업체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분양가 자율화가 없는 게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 당시 분양가 규제를 없애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참여정부가 다시 분양가를 묶어버리니 업체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푸념이다.
그는 "물론 건설업체들이 시장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며 "하지만 최소한 주택거래에 숨통이라도 터줬으면 하는 게 건설업체들의 다급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