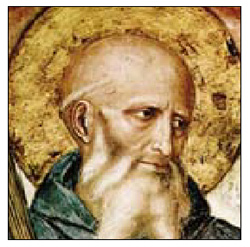|
개혁이 저항을 불렀다. 수도사들의 간청으로 은둔생활에서 벗어난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Benedictus of Nursia)’가 신앙공동체를 만든 지 10년여. 독살미수 사건이 터졌다. 범인들은 주변의 성직자. 베네딕투스가 요구한 경건한 생활과 규율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사건 직후 베네딕투스의 선택은 격리. 525년 제자들을 이끌고 험준한 몬테카시노 산으로 들어가 수도원을 세웠다. 더욱 엄격한 규율도 만들었다. 73개에 달하는 수도원 서약의 핵심은 청빈과 정숙ㆍ복종. 기도와 공동예배, 명상과 공부 이외 시간의 육체노동을 의무화했다. 하층민이나 노예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노동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일반시민이나 성직자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자리잡았다. 베네딕투스의 수도원 운영 원칙은 자급자족. 양을 키워 모직물과 구두를 생산했다. 목재며 맥주ㆍ포도주도 직접 만들었다. 물을 긷는 데 도르래를 처음 사용한 곳도 수도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지만 수도원은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팔아 재원을 늘려나갔다. 기도와 예배시간의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을 베네딕투스는 이렇게 일축했다. ‘산을 옮기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곡괭이와 삽이다.’ 현대 노동윤리와 똑같다. 수도원을 최초의 대기업으로 보는 시각도 이런 이유에서다. 갈수록 번창한 수도원은 베네딕투스 사망(543년) 무렵 30여개로 불어났다. 고대 학문을 보존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제도 발전에도 공헌한 수도원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 수천 개로 늘어나 유럽 전역의 경작지 중 30%를 소유했다. 인류역사상 이렇게 성공한 기업도 찾기 힘들다. 1220년 성인으로 추종된 베네딕투스의 축일은 7월11일. 노동가치관의 뿌리와 자본주의의 씨앗을 생각나게 만드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