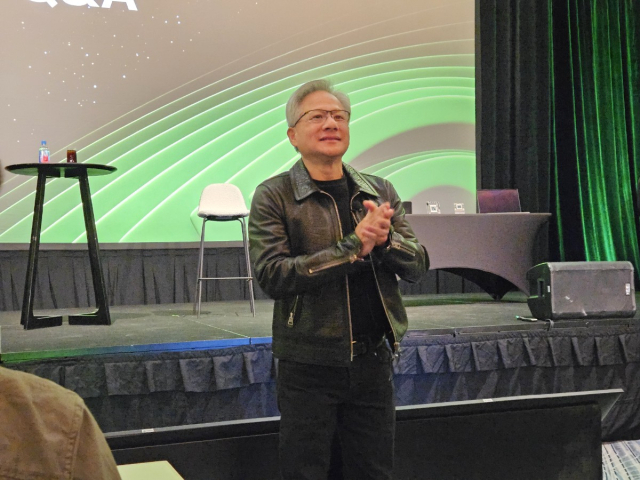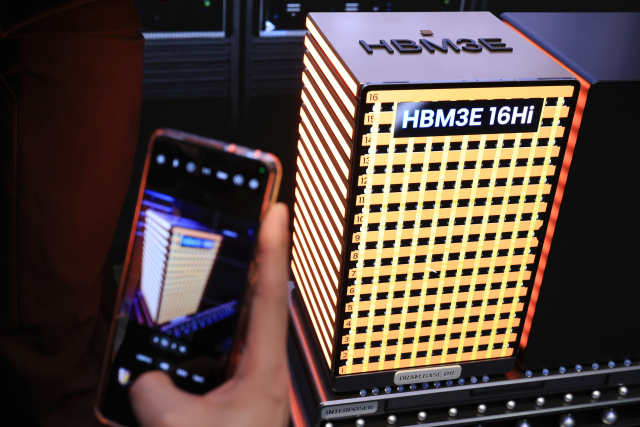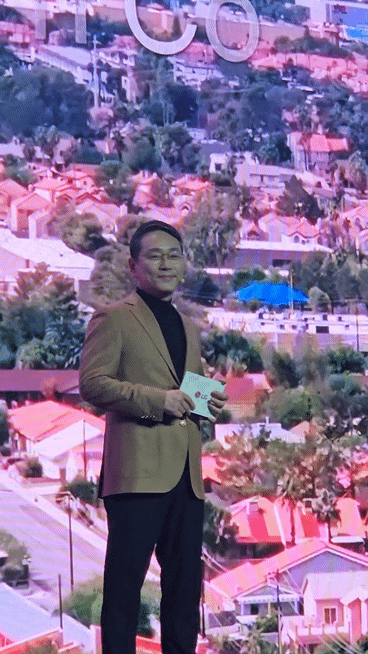정권이 바뀔 때마다 으레 농어촌 부채탕감이라는 공약으로 순진한 농민들을 유혹해왔다. 그러나 이들 이벤트성 공약은 농어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었고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늘어나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농어촌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1960년대 초반 농어촌에 만연한 고리채는 농어민의 등을 휘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봤자 이자로 다 나갔다.
5ㆍ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선 기본경제계획을 발표했다. 군사정부는 기본경제계획의 일환으로 1961년 6월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한 데 이어 6월10일에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고리채법 등의 개혁조치를 선보였다.
정부는 1961년 7월12일 농어촌고리채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8월5일부터 농민들에게 빚을 신고하라고 했다. 그해 9월28일까지 신고된 농어촌의 빚은 510억환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농어민이 안고 있던 빚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당장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 농어촌 부채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2004년 농가부채는 가구당 2,700만원에 육박해 우루과이라운드(UR) 발효 직전인 1994년의 788만원보다 10년 사이 세 배 이상이나 불어났다.
반면 농가소득은 10년 동안 42.7% 늘어나는 데 그쳐 UR협정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농어촌부채 특별경감을 외친다.
그러나 농어촌을 진짜 잘 살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