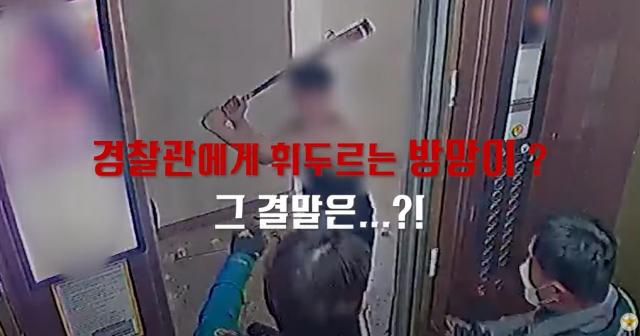사이버 세상, 현실세계를 뒤흔들다<br>무한한 정보·집단지성 탄생등 긍정적 효과 불구<br>개인정보 유출·음란물·악성 댓글등 그늘도 커져<br>정부차원 대책은 '재갈 물리기' 비판에 지지부진
한때 사이버 공간은 ‘정보의 보고’로 불리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원동력으로 각광받았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이동,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무한한 정보, 그리고 서로 모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집단 지성 등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 탄생을 촉발시킬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갈수록 거대한 힘을 갖게 되면서 드리우게 된 그림자,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유언비어나 악성 댓글, 음란물, 검증되지 않은 저질 정보 등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범죄로까지 연결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익명성이 가져온 그늘들=지난 4월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은 인터넷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사회적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모니터 화면 뒤에 숨어 글을 올리는 익명성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할텐데’라는 의식 속에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 가수 나훈아와 관련한 해프닝, 2005년 6월 ‘개똥녀’ 논란 등은 모두 인터넷 뒤에 숨은 익명성이 부른 범죄였다.
인터넷의 또 다른 공격양상은 개인정보 침해로 나타난다. 개인정보 유출은 명의도용, 스팸,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를 양산한다. 또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대, 인터넷 산업에 대한 신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중국의 대표적인 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라고 치면 한 페이지에서만도 130여개에 달하는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이름ㆍ주민번호ㆍ차량번호ㆍ가입기한 등과 함께 빼곡히 나타난다. 국내 개인정보가 한국은 물론 멀리 중국에서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제2차 범죄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투자 없이 말로만 ‘고객정보 보호’=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정보보호 불감증은 화를 더 키우고 있다. 2월 국내 최대 온라인쇼핑몰 옥션이 해킹을 당하면서 2,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3월에 KT와 다음 등 9개 업체에서 해킹으로 100만건의 개인정보가 다시 빠져나간 것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중 텔레마케팅과 무단 회원 가입 등 피해를 입은 비율은 2005년 43.2%에서 지난해 61.9%로, 개인정보 무단도용 비율도 45.2%에서 58%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사례는 기업들이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 전문대학원장은 “기업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는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사고는 한국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 사각지대 너무 많다=문제는 사태가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처럼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악성 댓글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세우고 건전문화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 역시 사각지대에 둘러싸여 있다. 최근 LG파워콤의 LG그룹 계열사 임직원 개인정보 누출 의혹에서 보듯이 서비스 이용고객을 제외한 경우, 특히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허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법률간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의 분산 ▦전문 독립기구 부재 등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대구 성폭력 사건 이후 인터넷 윤리 강화 차원에서 캠페인 등을 펼치려고 했지만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