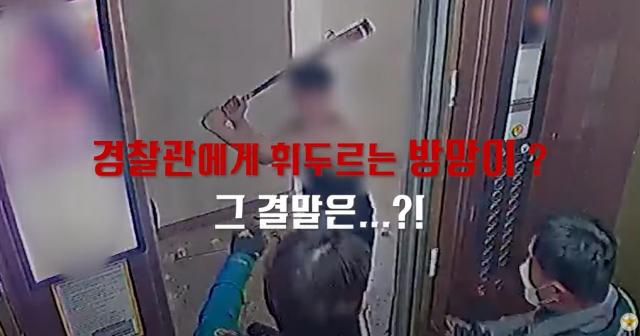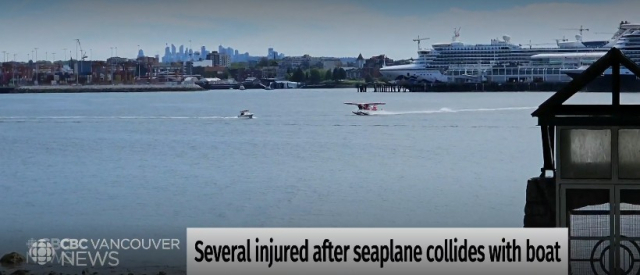기자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10년 전을 오버랩한다. 초 단위로 변하는 시장, 곳곳에서 쏟아지는 국민의 한숨,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고강도 정책들…. 내용만 다를 뿐이지 2008년 현재의 상황은 외환 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당시와 판박이다.
그래도 그때는 일할 맛(?)이 났다. 시장은 여의도(금융감독위원회)와 과천(재정경제부)의 관료들이 뿜어내는 작은 ‘립 서비스’에도 반응했다. 몇몇 관료들에게 ‘관치(官治)의 화신’이라는 볼썽사나운 별칭이 따라 붙었지만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카리스마’라는 선(善)으로 포장됐다. 국민도 이를 용납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절대 목표를 등에 업었다지만 그들에게는 시장을 움직이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 항상 따라다녔다. “관은 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억지 논리’로 시장을 휘젓고 다니던 어느 전직 관료의 카리스마에 대한 향수(鄕愁)가 여전한 것은 기실 스스로가 만들어낸 산물(産物)이었다. 그들의 카리스마를 위기의 시대에 한때 통용됐던 ‘관치의 미학’ 으로 치부한다면 너무 야박하다.
시계를 현재진행형으로 돌려보자. 이른바 ‘MB 노믹스’를 뒷받침한다는 이 시대의 경제 관료들은 어떤가. ‘컨트롤타워’라고 자칭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막강 파워의 부처를 이끌고 있는 전광우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는 고위 관료들.
불행하게도 지금의 시장에서 이들의 카리스마를 찾기는 너무 힘들다. 장관을 향해서는 “언제 바뀌느나”는 말만 나오고, 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는 “캐파(함량)가 떨어져. 일할 만한 사람이 안 보여”라는 민망한 소리만 들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요즘의 정책 방향을 보고 있노라면 도통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다. 시장에 대한 전파력과 설득력만을 따진다면 지금만큼 허약한 관료집단을 찾기 어렵다. 오죽하면 현직 고위 관료의 입에서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아 바꾸려 해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나올까.
정책의 절반은 사람(당국자)으로부터 이뤄진다고 했다. 속칭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지만 기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는 사령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시장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 지금도 해외발(發) 악재로만 치부한다면 비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