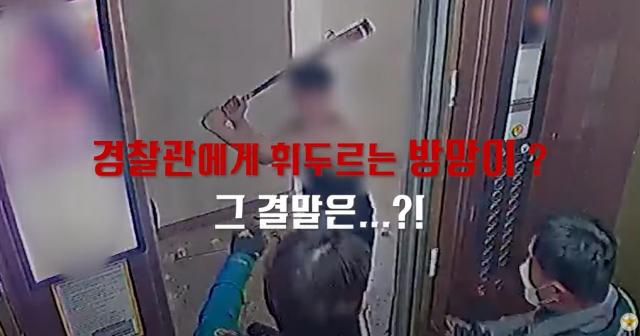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급강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해 고용감소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판매는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장 주문도 2년 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사정은 유럽이나 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자동차 값을 15~20%나 깎아줘도, 의류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줘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본과 중국 역시 감세 및 경기부양 조치를 취했지만 경기하강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하강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유럽도 가계의 저축 수준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위험이 덜한 편이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신용경색-실업증가와 소비위축-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위축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큰 시련이다. 이미 자동차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반도체ㆍ조선ㆍ해운ㆍ철강 등 주요 산업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상수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외환보유액은 줄고 단기외채는 계속 불어나는 등 외환사정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올해 4%대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실물경제까지 덮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수부진 속에 그런 대로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마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천재지변의 상황으로까지 비유되는 이번 세계경제 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국가적 위기관리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도 당파적 이해를 떠나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계 역시 경제가 난국에 빠져들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임금인상 주장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