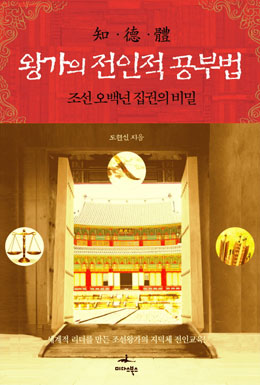홈
문화·스포츠
문화
[책과 세상] 조선왕조 500년의 힘은 지덕체 교육
입력2011.09.09 15:51:42
수정
2011.09.09 15:51:42
■ 왕가의 전인적 공부법 (도현신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br>왕족, 단순 암기·주입식 교육 탈피<br>신하들과 토론 통한 지혜 습득 등<br>오늘날 리더들이 배울만한 교훈 담아
 | | 조선의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쉼없는 공부와 노력을 통해 성군으로 키워졌다. 조선 왕실의 주요 공간인 경복궁 향원정의 모습. |
|
왕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조선 왕실의 왕자는 오늘날 수험생 못지 않게 치열하게 살았다. 동화 속 왕자님이 누리는 여유롭고 호사스런 삶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보통 밤 11시에 잠이 들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 길어야 5시간 적게는 2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공부가 계속됐다. 아침 조강(朝講)과 정오의 주강(晝講), 저녁의 석강(夕講)과 밤까지 이어지는 야대(夜對) 등 하루 4차례의 학습시간이 있었다.
이 책은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을 지식인의 양반 문화 때문이 아니라 이씨(李氏) 왕조의 지덕체(知德體) 지도자 교육이 이뤄낸 집단적 모범이 근간을 이룬다고 분석한다. 왕자일 때는 서연(書筵), 왕이 된 뒤에는 경연(經筵)을 통해 공부를 해야 했고 왕실 종친들은 종학(宗學)으로 리더십 교육을 받았다.
왕족의 공부는 단순한 지식암기나 주입식 교육은 배제했다. 학식이 뛰어난 신하들과 시경ㆍ논어 같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거나 한국 및 중국 등의 역사에 대해 토론하면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배웠다. 또한 신하들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최신 정보를 접함으로써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알 수 있었다.
덕이 왕도의 기본이라 예절을 통해 덕을 쌓는 것은 생활화돼야 했다. 부모님이 주무시기 전에 손수 잠자리와 이불을 펴드리는 것은 왕자의 도리였다. 수족 같은 신하와 궁녀가 있었지만 효와 예절은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 여겼다. 아침ㆍ점심ㆍ저녁과 잠자기 전의 문안인사는 당연한 의무였다.
건강한 왕이 태평성대를 이끈다 하여 체력 증진도 필수였다. 공자가 강조한 예절(매너)ㆍ음악ㆍ말타기ㆍ서예ㆍ수학ㆍ활쏘기의 육예(六藝ㆍ여섯가지 예술)는 반드시 익혀야 했다. 승무와 격구도 틈틈히 하면서 말이다.
따라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왕의 장남일지라도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은 세자 시절 서연 학습을 게을리하고 기생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 결국 '폐세자'되었다.
이 같은 지덕체의 전인적 교육은 성군과 현군을 키웠고 이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뛰어넘어 근대 민본주의 사상을 실천할 수 있었다.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룬 왕인 성종은 자신을 키워준 유모 백씨가 관직을 청탁하자 "관직은 공기(公器)인데,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은밀히 만나 사람들에게 작위를 준다면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병자호란으로 도탄에 빠진 나라를 일으킨 효종은 왕자 시절 청에 인질로 잡혀있을 때 "금이나 옥, 비단 같은 보물 대신 우리나라의 포로를 돌려주시오"라며 백성을 먼저 살폈다. 또한 기근에 시달리던 백성을 가엾게 여긴 현종은 "흉년 때문에 전세(田稅ㆍ토지세)가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니 6도에서 거둔 전세는 다가오는 봄에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라"며 덕으로 통치했고 성군 정조는 "백성과 관계되는 일이면 지체 말고 즉시 알리라"고 누차 강조했다.
오늘날의 정치 리더, 기업 CEO들이 배울만한 지도자의 덕목이 시대를 관통해 교훈을 전한다. 2만3,000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