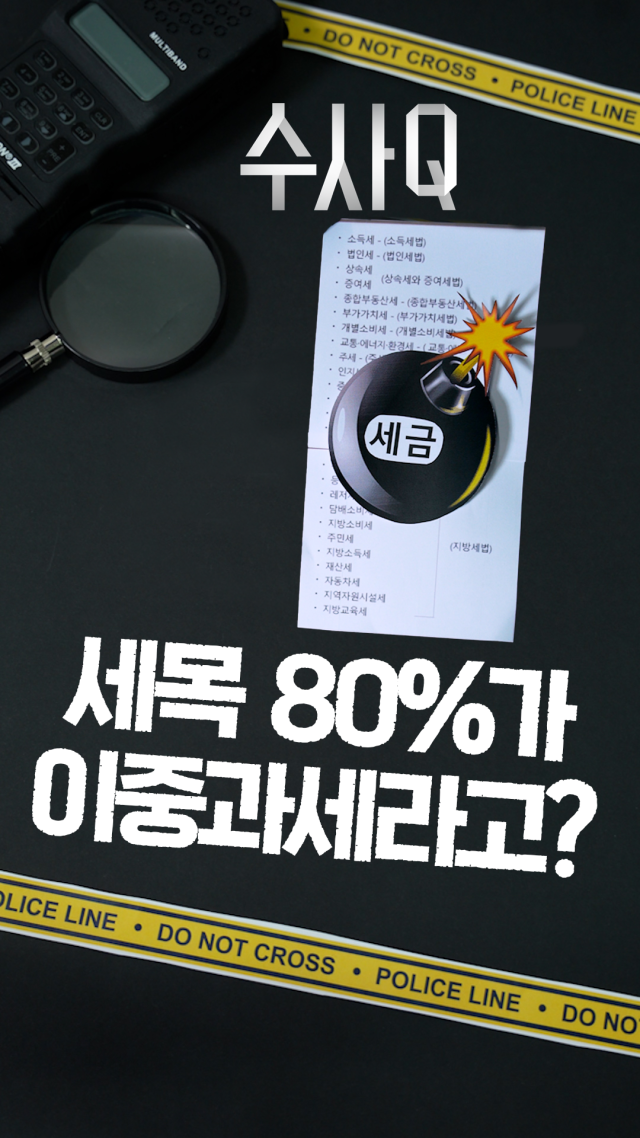국내 제조업체들의 현금 보유액이 사상최대인 40조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들이 비축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지난 6월말 현재 총 3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말 대비, 6개월 사이에 무려 21%(6조7,000억원)나 급증한 것이다. 돈이 넘쳐 나도 투자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쌓아 두고 있는 꼴이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 본지 14일자 1면 보도 제조업체들의 유동성이 이처럼 풍부해진 것은 기업들이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고 있는 데다 저금리에 힘입어 수지가 크게 개선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제조업체들은 34조4,000억원의 흑자를 올렸으나 이를 거의 빚 상환에 사용했으며 여유 돈은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경향은 정권말과 대선에 맞물려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금은 넘쳐 나는데 굴릴 데가 마땅찮기는 대기업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요즘 기업이나 은행마다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 한다. 보험회사 가운데는 2조원대의 자금을 미국에 현금 투자 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투자가 이처럼 움추러들다 보니 미래 성장잠재력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신규고용 창출은 올 스톱 상태이며 고학력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의 풍부한 유동성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투자 기피나 지연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경쟁력 저하를 자초하기 마련이다. 우선 연구ㆍ개발(R&D)투자를 소홀이 할 경우 영역확장의 기회는 물론, 경쟁력에서도 뒤져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기술ㆍ정보(IT) 산업은 6개월마다 사이클이 바뀔 정도로 `시간이 곧 자산`인 시대다. 현재 위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욱 중요하다. 제조업체들이 현금을 비축하는 속내를 이해할만하지만 지나친 보수적 경영은 퇴보를 부르기 쉽다. 불황 때일수록 호황 때를 준비해야 하듯 미래 역량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 벤처 정신이 아쉽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도 레임덕만 탓할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의 활로를 트고 의욕을 북돋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