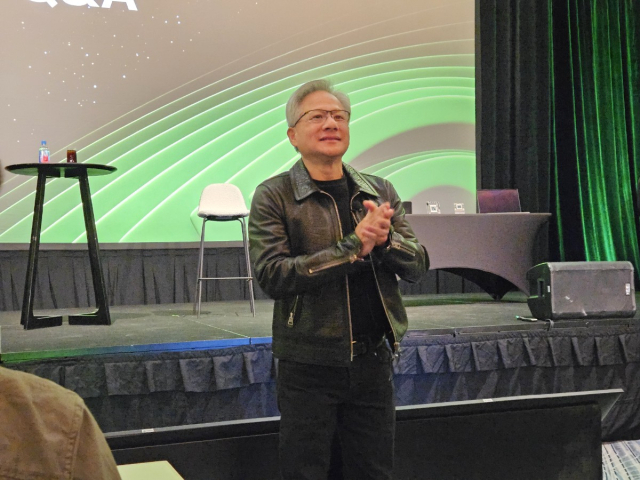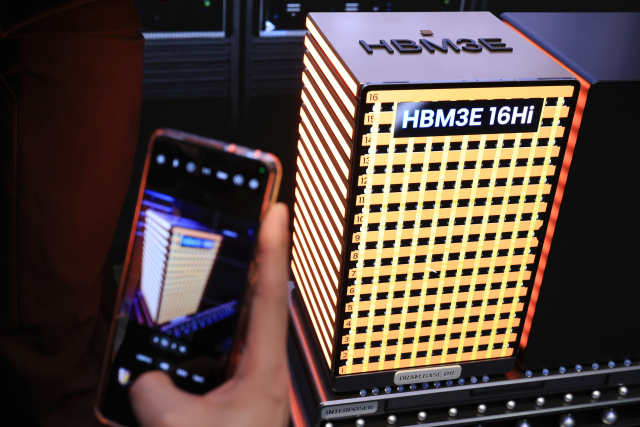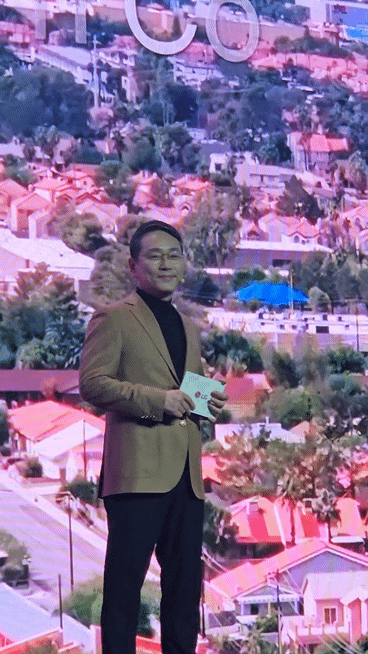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고려 때 우리 선조들은 포도주를 마셨다
“우리 전통술을 옛 문헌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사실 1600년대 주방문에 기초하여 그대로 복원한 술을 주변인들에게 권하면 대개는 크게 감동받지 못하는 것을 본다. 몇 세기 전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과 풍습은 불과 몇 십 년 전과 비교해볼 때 아주 크게 바뀌었다. 세계적인 명주들이 넘쳐나고, 또 서구화된 입맛들을 맞추려면 우리 옛것을 고집할 수는 없다. 필자도 그 부분에 있어 100% 공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우리 술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 전통술 복원은 순전히 구전(口傳)에만 의존할 수 있던 것은 아니고, ‘산가요록’(1450년), ‘음식디미방’(1600년대), ‘산림경제’(1700년대), ‘임원경제지’(1900년대) 등 옛 문헌이 남아있어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가능했다. 그렇다고 100% 복원된 것은 아니고, 흔적만 맴맴 돌며 안타깝게 하는 술도 있다.
태조실록 1398년 음력 9월 1일 기록을 보면 “임금이 수정포도(水精葡萄)를 먹고 싶어 했는데 경력 김정준이 바치다.” 이어 9월 3일에는 “한간이 수정포도를 바치자, 왕의 병이 이로부터 회복되다.”라고 나온다. 세종대왕도 병상에서 포도만 찾았다고 한다. 수정포도는 추측컨대 청포도를 의미한다. 16세기 문인 심수경, 황섬이 포도그림을 보고 읊은 시를 보면 오늘날의 적(赤)포도가 그 당시에도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려 때 이색은 “누가 만 개 알갱이에 새콤달콤 맛을 숨겨두었나? / 옥색 맑은 진액 이와 혀 사이로 번지는구나”라는 시를 지었다.
#옛 전통 포도주 제조법 복원 못해 아쉬워
중국 한나라 때에 포도주를 바쳐 벼슬을 얻었다는 뇌물 비리사건이 있던 것을 보면 동양에서는 유럽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포도주를 마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포도주를 마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원나라 황제가 고려의 왕에게 포도주를 선물한 일이 역사에 거듭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 때부터 이미 포도주를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이상적이 “포도주 백 잔 올리겠사오니, 포도 그림 한 폭만 그려주세요”라는 시를 남긴 것으로 보아 20세기에 이르도록 포도주에 대한 감상은 문사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그 포도주를 어떤 재료로, 어떤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다만, 포도를 으깨어 효모를 투입하는 방식의 서양식은 아니고, 전통누룩이나 곡물을 이용했을 거라는 추측만 해왔다. 지난해부터 향음에서 전통누룩과 쌀로 발효제를 만들어 포도즙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1년 정도 숙성한 후 맛을 보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썩 괜찮았다. 몇몇 셰프들에게 평가를 부탁했더니 “풍부한 맛은 좋은데, 유럽 와인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하지만 최소한 저가 와인보다는 훨씬 낫다”는 반응이었다. 다소 희망적인 일에 신선한 기쁨을 느꼈으나 상품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대목에서 정말이지 자신이 없었다.
#내 오감을 깨운 삼해소주가의 포도주
그러던 차에 내 오감(五感)을 몇 번이나 의심할 만한 일이 생겼다. 우리 술을 생산하는 분들 중에 아주 막역하게 지내는 ‘삼해소주가’ 김택상 선생이 있다. 이달 초 선생의 도가에 우연히 들렸는데 “이 원장, 이번에 새로 한 건데 맛 좀 봐줘”라며 증류주 한 잔을 권했다. 그 맛을 생각하면 지금도 혀끝이 나도 모르는 결에 감아 오르며, 내 몸의 세포에 서서히 불이 붙어 오르는 것 같다. 필자가 아는 선생의 술은 보통 45도를 넘어가는데 이 술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부드러움이 30도 내외가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도수는 45도가 맞았다. 첫 향은 장미꽃밭을 멀리서 지날 때 느끼는 알듯 모를 듯 끌리는 향과 그다음 코를 잔에 대었을 때는 이슬에 젖은 풀향기 같았다. “어어....... 선생님.... 좋은데요. 뭐에요?” 라고 대뜸 물었더니, 씨~익 웃으며 “브랜디야”라고 대답했다. “브랜디요? 포도주 증류하셨어요? 베이스가 어디 있어요?”라고 재촉했다. 더 놀라게 한 것은 방금 맛 본 증류주보다도 선생의 도가 한켠에 놓여 있던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였다. 증류주의 술덧으로 쓰인 발효주 항아리 단지를 열자 온 방안에 그 향기로움이 맑고 은은하게 퍼졌다. 지금도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감동을 잊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포도주구나! 심장이 쿵! 했다.
며칠 후인 10월의 마지막 밤에 서울 서촌에서 열리는 우리 술 축제, <향음예찬>에서 ‘삼해소주가’ 김택상 선생의 한국형 브랜디 처녀작이 출시된다. 서양와인을 따라가려는 수고를 들이지 말고, 우리의 문화적 역량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일천년여 동안 시인묵객, 왕호장상들의 로망이었던 포도주. 아주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슬퍼했던 그 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재연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천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다. /이화선 사단법인 우리술문화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