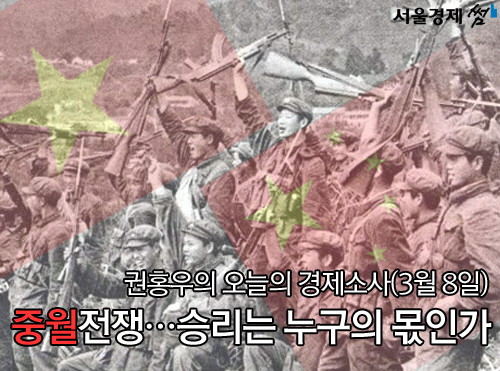중공군이 더 이상 전쟁범죄행위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평화 열망의 표시로 중공군의 안전철수를 보장한다. 추격전을 하지 않겠다.’ 베트남이 1979년 3월 8일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발표한 입장의 골자다. 같은 날 중국 측도 ‘철군을 이미 시작했다’는 정보를 흘렸다. 중국인민해방군이 5개 사단 8만 병력을 동원해 베트남을 침공한 지 19일 만에 중월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공식적인 종전 날짜는 화궈펑(華國鋒) 중국 공산당 주석이 ‘전쟁 종결’을 선언한 3월 16일. 기록에는 ‘29일간의 전쟁’으로 나오는 중월전쟁은 발발에서 종전까지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중국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베트남을 침공했으며 부랴부랴 철수했을까. 20세기 들어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물리친 베트남을 세계는 경탄의 눈으로 바라봤다.
프랑스와 싸울 때부터 전후복구까지 30여년간 연 200억 달러의 거액을 지원했던 중국이 통일 베트남을 침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마치 역내 패권국가인양 으스대던 베트남이 친중국 공산국가인 캄보디아를 침공한데다 소련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하노이와 사이공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처음 방문한 중국 최고의 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카터 대통령에게 말한 대로 ‘버릇없는 어린애의 엉덩이를 때려주겠다’던 중국은 막상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주력 사단이 캄보디아 전선에 나가 있던 상황에서 베트남의 2선급 부대와 민병대는 중국군에게 평균 1대3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 정규군이 전선에 도착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하던 터에 베트남 민병대는 세계 최강 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쳤던 경험을 살려 중국군을 괴롭혔다. 중소국경에 소련군 병력이 집결한다는 소식도 중국을 짓눌러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부추겼다.
저항에 봉착한 중국은 병력 10만명을 추가로 투입했으나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 베트남이 그토록 강했을까. 그랬다. 풍부한 실전 경험에 침략자를 격퇴하겠다는 의지까지 불탔다. 퇴역 병사 뿐 아니라 여성들까지 총을 들고 나섰다. 반대로 중국군은 정규군이었으나 약체였다. 일부 부대에서는 철모도 없는 전투병의 물자를 노새가 날랐다. 보병의 기본화기도 56식 반자동보창(소련제 SKS 소총 복제품)이었을 뿐 북한의 정규군은 물론 노농적위대까지 보급된 AK-47소총(중국명 56식 자동보창)도 분대당 두 정밖에 없었다.
거대 중국을 무찌른 베트남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럴 만했다. 서방진영과 공산진영을 가리지 않고 강대국들을 잇따라 물리쳤으니까. 종전 직후에는 중국군에 대한 갖은 혹평이 쏟아졌다. ‘종이 호랑이’라는 조롱은 그나마 약과. 미국의 타임지는 고슴도치에게 찔려 반쯤 죽은 코끼리 만화를 지면에 실었다. 중국은 모멸감을 느꼈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중월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불분명한 전쟁이다.
망신을 당하긴 했어도 중국은 애초에 미국에 언질했던 대로 전쟁을 20여일 만에 끝냈다. 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의 회고록에 따르면 미국은 중월전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최대한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써먹었다. 당시로서는 최대의 적인 소련의 동맹국마저 침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며 미국은 소련을 소리나지 않게 흔들었다.
보다 긴 호흡으로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면 중월전쟁에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중국일지도 모른다. 덩샤오핑의 개혁에 반기를 들려던 군부와 기득권층이 군 장비의 열세와 병력 운용의 낙후를 절감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는 계기가 중월전쟁이었으니. 당시 국방비의 약 27%에 해당하는 34억 4,600만 위안을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는 통에 경제 개발 계획에 일부 차질을 빚은 중국 지도부는 중월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중국군의 현실을 경제 최우선 정책의 추진력으로 삼았다.
중국이 북한과 혈맹관계를 보다 다진 시기도 이 때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의 베트남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거나 반대 의사를 보낼 때 중국을 지지한 국가는 딱 두 곳이었다. 자유 캄보디아와 북한, ‘폴 포트 정권’으로 잘 알려진 자유 캄보디아는 친베트남군에 의해 쫓겨난 망명정부였으니 실질적으로 중국 편에 선 곳은 북한 하나 뿐이었다.
베트남도 겉으로는 우쭐했으나 속으로는 변화를 겪었다. 소련이라는 뒷배가 그리 든든하지 않다는 사실을 차츰 깨달았다. 중국과 베트남은 ‘29일의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도 수차례 국경 분쟁을 겪었으나 198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전후해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해 1992년에는 국교를 정상화하고 1999년에는 국경선을 확정했다.
37년 전의 중월전쟁은 시공간을 확대한다면 과거 완료형이 아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소설 삼국지연의 속에서 촉한(蜀漢)의 제갈량이 남만의 왕 맹획을 일곱번 잡고 풀어준 끝에 복종시켰다는 칠종칠금(七從七擒) 얘기는 나관중(羅貫中)의 상상력 여부를 떠나 두 민족의 분쟁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다는 사실을 얘기해준다. 남의 나라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앞날에도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신무기로 무장한 중국군이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 한만 국경을 넘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베트남의 변화도 괄목상대할 대상이다. 투자가 늘고 교류가 증진되는가 싶더니 어느 새 우리나라의 3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떠올랐다. 베트남이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미국이 돈을 대줘 파병한 베트남전 참전 직후인 1960년 중후반이래 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예전에는 수출대상국 순위가 미국, 일본, 베트남이었으나 요즘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바뀌었으니 시대의 흐름이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앞으로 50년 후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미국의 패권은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과 중국간 경제협력은 어떻게 변해갈까. 평균 연령 28세인 인구 9,342만명을 지닌 베트남은 고성장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까.
/권홍우논설위원겸 선임기자 hongw@sed.co.kr
* 중국의 베트남 지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써나가는 유용태 서울대 교수(역사교육학과)의 ‘환호 속의 경종’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후근부대(中國後勤部隊)’라는 이름 아래 베트남 전선에 연인원 32만 명의 병력을 보냈었다. 한때 17만명이 동시에 월맹(북베트남)에 주둔했던 이들 가운데 1만 5,000여명의 방공포부대의 활약이 가장 컸다. 당시 격추된 미군기의 대부분이 2,000여회의 작전을 치른 중국군 방공포 부대의 전과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