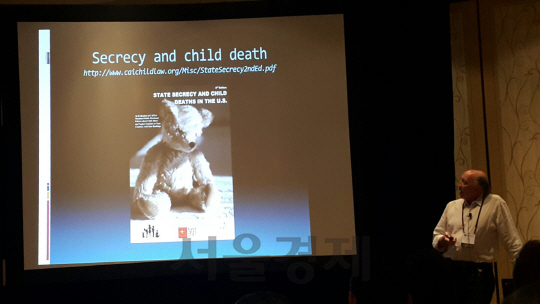지난달 17일(현지 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전미탐사보도협회(IRE) 연례 콘퍼런스’의 한 강의장. 더프 윌슨(Duff Wilson) 로이터 기자가 ‘아동학대에 대한 탐사보도’를 주제로 한 경연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자 강연장이 술렁였다. 그가 이날 발표한 기사의 뼈대는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 등 약물에 중독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였다. 말 그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었다. 그는 “아이들은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신생아 사망 기록 등 주요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강의에 나선 그렉 스미스(Greg Smith) 뉴욕 데일리 뉴스 기자는 첫 질문으로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를 던졌다. 그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취재한 건 ‘우리가 맡긴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였다. 그가 뉴욕시의 어린이 위탁시설 안전보고서를 살펴보고, 소송자료까지 조사하는 등 취재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정부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 스미스 기자는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심폐소생술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911’ 통화에서 확인했다”며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보육시설이 해당 법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들의 운용 시스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른바 ‘위기의 아이들’이 늘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들 사건이 알려지면서 드러나는 공통 분모는 ‘정부의 부재’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바다 건너 미국도 마찬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탓에 ‘예고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죽은 아이 불알 만지기’란 의미의 비아냥도 단골메뉴였다. 원인은 간단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탓이었다. 사건을 막지 못한 만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주워담는 쓸데 없는 노력보다는 앞으로는 대비해 ‘제2·3의 사건’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은 비단 국내 언론의 생각만은 아니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는 ‘KPF 디플로마 탐사보도’ 과정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