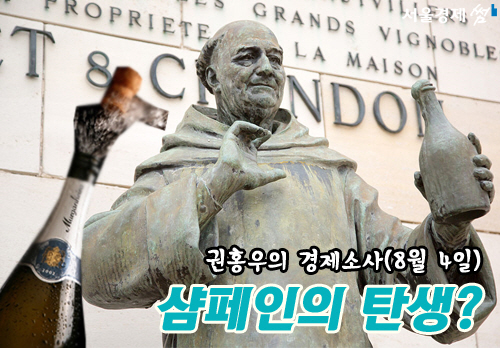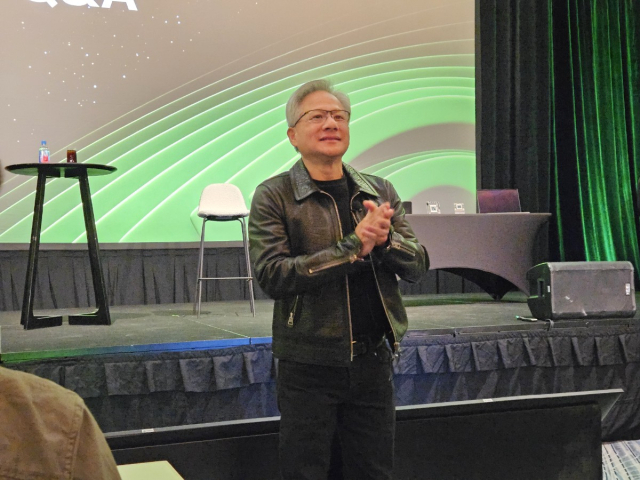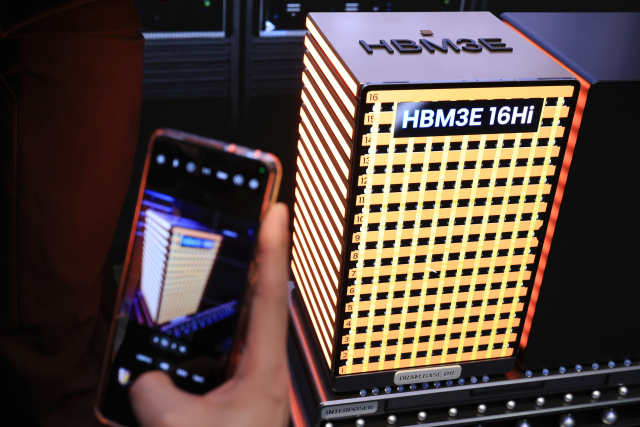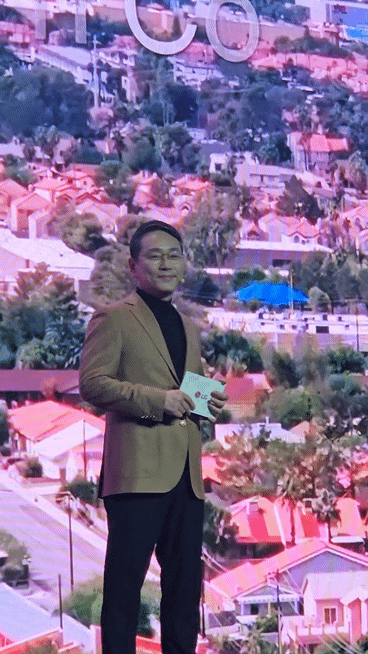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통칭 샴페인)은 생년월일이 있다. 1693년8월4일. 동 페리뇽(Dom Perignon) 수사가 이날 샴페인을 발명해냈다.’ 프랑스 샹파뉴(영어 발음 샴페인) 지방은 자신들이 발포성 와인의 원조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마치 사실처럼 전해지는 구전(口傳)에는 보다 극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 오비레 수도원은 고민을 갖고 있었다. 미사에 쓰일 포도주를 쌓아놓은 포도주 창고에서 가끔 병들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이를 미친 와인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러나 장님이어서 그런지 남다른 미각을 갖고 있는 페리뇽 수사는 폭발하는 와인에 흥미를 가졌다. 오랜 연구를 통해 그는 맛이 일정한 발포성 와인을 빚어내는 방법을 찾았다. 이게 바로 전세계 발포성 와인의 기원이다.’
샹파뉴 지방의 구전에는 후렴구처럼 설명 하나가 따라 붙는다. 페리뇽 수사가 입안에서 터지는 탄산의 향이 뛰어난 발포성 와인을 시음하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보게, 나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다네.’
그럴싸하지만 사실일까. 널리 퍼진 구전일 뿐이다. 중세 초기부터 발포성 와인을 즐겼다는 다른 구전도 있다. 최소한 1544년부터는 기록에도 등장한다. 영국인 물리학자 크리스토퍼 메렛은 1687년 발포성 와인 제조법을 책자로 펴냈었다. 페리뇽 수사가 장님이었다는 점도 사실과는 다르다. 평소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와인을 음미했을 뿐이다. ‘별을 마신다’는 표현 역시 역시 19세기에 등장한 광고 문구다.
페리뇽 수사를 이은 후배들의 창작이라는 ‘샴페인의 탄생 신화’에는 진실도 섞여 있다. 무엇보다 페리뇽 수사가 샴페인 주조 공정 표준화에 공을 세운 점은 분명하다. 뛰어난 발포성 와인을 얻기 위한 포도주 혼합은 물론 지나친 발효로 인한 폭발을 막는 방법도 고안해냈다. 우선 영국에서 두꺼운 유리병을 수입해 와인을 담았다.(석탄의 화력을 이용하는 영국산 유리병 신제품은 나무의 화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의 와인 병에 비해 훨씬 강하고 두터웠다). 코르크 마개에는 철사를 덧댔다.
페리뇽 수사에 의해 규격화한 샴페인을 귀족사회에 퍼트린 인물은 오를레앙 대공(자본주의 초기 3대 버블의 하나로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가 야기한 미시시피 주식투기 사건을 추인한 인물이 바로 오를레앙 대공이다). 루이 14세 사후 1715년부터 1723년까지 섭정으로 프랑스를 다스렸던 그가 좋아하는 샴페인, 특히 돔 레리뇽은 파리 사교계의 연회용 주류로 떠올랐다.
오늘날 고급 발포성 와인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동 페리뇽’을 위시한 샴페인 신화는 과장과 증폭 과정을 넘어 상징화 단계도 밟았다. 프랑스는 ‘만들어진 전통’인 샴페인의 희소가치를 지키려 상퍄뉴 지방 이외의 발포성 와인에는 ‘샴페인’이라는 상호를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가 애써 지킨 샴페인은 해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1800년대에 약 30만병이던 샹파뉴의 삼페인 생산은 2015년 14억2,800만명으로 치솟았다. 와인과 샴페인이 주산물인 샹파뉴 지방은 프랑스 내에서도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정작 동 페리뇽을 비롯한 고급 샴페인은 절반 이상이 해외로 팔려 나간다. 프랑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고급 샴페인의 절반 가량도 외국인 관광객의 목젖을 적신다. 수입국은 영국이 3,415만병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미국 2,051만병, 독일 1,190만병, 일본 1,180만병 순이다. ‘샴페인’이라는 브랜드의 향에 취해서일까. 한국의 수입량은 약 60여만병으로 순위권 밖이지만 고가 샴페인의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샴페인을 딸 때 ‘펑’하는 소리처럼 돈을 펑펑 써대던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조롱받던 시절이 떠오른다. 1980년대 중후반 반짝 호경기에 따른 과소비 열풍이 한창일 때 외국 언론은 이렇게 비웃었다.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당시 한국인들의 샴페인 축배는 별을 마시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라는 벌을 마시는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요즘이라고 인식이 달라졌을까. 접대와 소비문화를 정상화하자는 김영란 법에 온통 벌벌 떨고 있으니.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