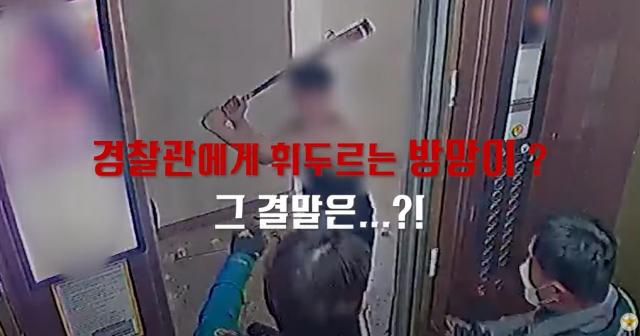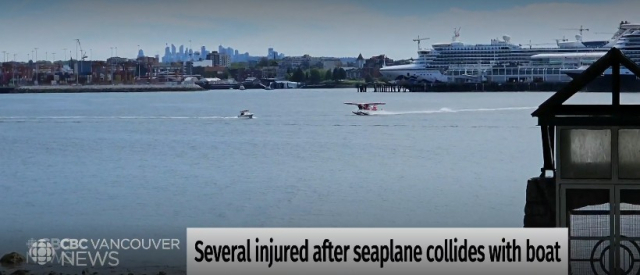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29년 대공황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수 지표로 자리 잡았던 GDP의 대체지표를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의 합계로 구하는 GDP가 실물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GDP의 가장 큰 문제는 달라진 소비방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서비스나 공유경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 요즘 음악을 감상하려면 CD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1개월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권을 결제한다. 이때 음악이라는 생산물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해졌다.
부의 분배와 불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열풍에 기름을 부은 것은 빈부격차인데 ‘합계’의 개념인 GDP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을 토론할 때 GDP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며 “분배효과, 규모가 아닌 구성의 왜곡, 정책의 미래 효과 등은 현재의 GDP만큼이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GDP의 오차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일본은행(BOJ)은 2014년 GDP 성장률을 기존 내각부의 집계와 다르게 발표했다. BOJ는 세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GDP가 2.3% 성장했다고 봤지만 내각부는 생산과 지출을 바탕으로 같은 기간 GDP가 0.9%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지표에 따라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GDP를 대신할 척도는 아직 마땅치 않다.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행복수준을 보여주는 데 GDP만 한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폴 시어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GDP를 비판하기는 쉽지만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GDP에 바탕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되 더 넓은 측정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