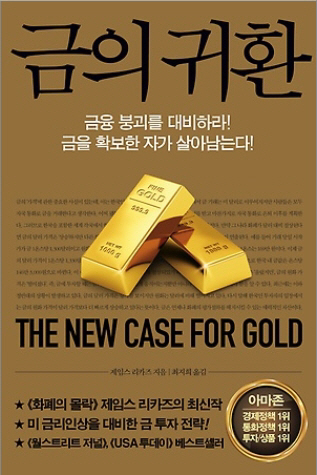국제정세의 불안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 보호무역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국제교역은 얼어붙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 붕괴는 지난 2008년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국가나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베스트셀러인 ‘화폐전쟁’, ‘화폐의 몰락’ 등을 쓴 거시경제 분석가 제임스 리카즈는 신간 ‘금의 귀환(원제 The new case for gold)’을 통해 다시 금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금이 확실한 보험이며 국제통화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화폐가 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모든 화폐의 가치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바뀌지만 오직 금만이 고정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금의 달러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금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금이 오른 게 아니라 달러가 떨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금값은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매번 제자리를 찾았다. 역시 금이 가장 안전한 가치저장 수단이다.
흥미로운 것은 금의 가치가 그 아름다운 색깔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 가운데 금은 물리적으로 희소성, 안정성, 내구성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원소라 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국제통화시스템에서 ‘금본위제’가 겉으로는 폐지됐지만 실제로는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다. 1944년 시작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금과 달러의 교환(금태환)을 통해 이를 보장했다. 1971년 ‘닉슨 쇼크’가 일어나면서 금태환은 금지되고 금본위제는 공식적으로는 폐지됐다고 여겨졌다.
저자는 이를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한다. 국제통화시스템에서 금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금 보유량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대표주자는 중국이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금 보유량은 지난해 7월 현재 1,658톤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광산업계의 채굴량과 중국으로의 수출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4,000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매년 100톤씩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목표는 미국 수준인 8,000톤이다. 중국 뿐만이 아니다. 독일과 국제통화기금(IMF)도 각각 3,000톤 가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각국의 이러한 노력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험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자산이 금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가 통화로서 금의 역할은 부정하면서 금고에는 금을 채우고 있는 이유다. 통화시스템의 붕괴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 제정이 필요하고 과거 브레턴우즈 체제를 만들 때처럼 금융강국의 발언권이 강해진다. 이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의 비율이 높은 ‘금 강국’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셈이다.
그러면 개인은 어떨까. 저자는 금의 비중을 투자 가능한 자산(유동자산)의 10%로 잡으라고 권고한다. 단기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보호 차원에서다. 금값은 달러 및 실질금리와 반비례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등의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 투자자들에게 최근의 가격 하락세는 좋은 매수 기회다.” 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