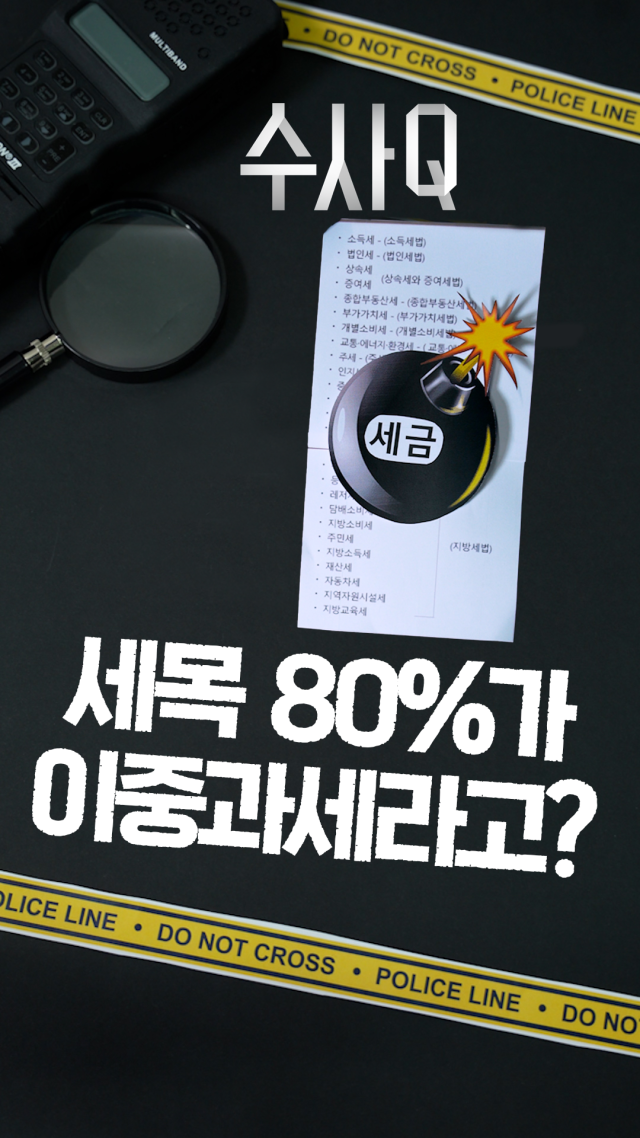할머니 한 분이 초록 애호박 대여섯 개를 모아놓고 앉아 있다.
삶이 이제 겨우 요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듯
최소한 작게, 꼬깃꼬깃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귀를 훨씬 지나 삐죽 올라온 지게 같은 두 무릎, 그 슬하에
동글동글 이쁜 것들, 이쁜 것들,
그렇게 쓰다듬어보는 일 말고는 숨쉬는 것조차 짐 아닐까 싶은데
노구를 떠난 거동일랑 전부
잇몸으로 우물거려 대강 삼키는 것 같다. 지나가는 아낙들을 부르는 손짓,
저 허공의 반경 내엔 그러니까 아직도
상처와 기억들이 잘 썩어 기름진 가임의 구덩이가 숨어 있는지
할머니, 손수 가꿨다며 호박잎 묶음도 너풀너풀 흔들어 보인다.
호박순 같은 여린 시절 있었지. 떡잎처럼 도톰한 발바닥으로 흙길을 달려갔지. 빛나는 살갗은 애호박처럼 탱탱했지. 덩굴손 뻗어 높은 울타리도 훌쩍 넘었지. 호박꽃 귓전에 어지간히 지분거리던 수벌들도 있었지. 이제 나는 머리에 달래 바구니 가득 이고, 이마에 밭두렁 논두렁 새겨 넣었지. 세상 물고 뜯던 이빨, 호박씨처럼 흩어진 입속은 블랙홀같이 신비롭지. 마침내 나는 완성되었지. 무릎이 귀를 넘도록 낮아지자 한없이 새롭고 미쁜 세상을 만났지. 철부지 애호박들이 닿을 수 없는 웅숭깊은 열매가 되었지. <시인 반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