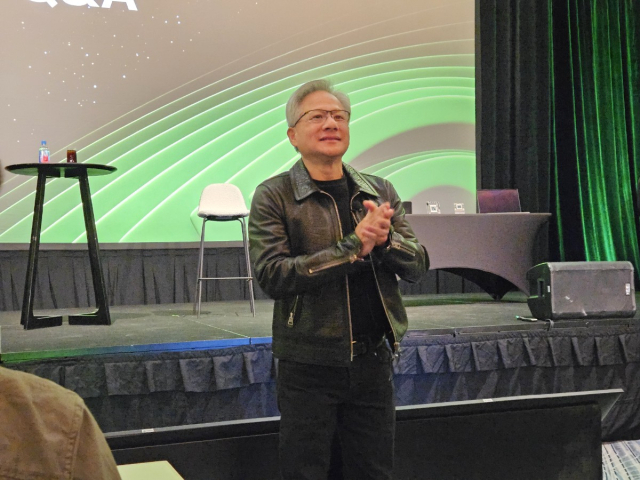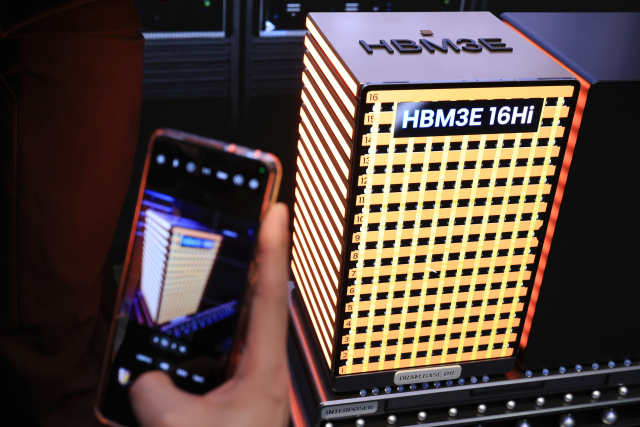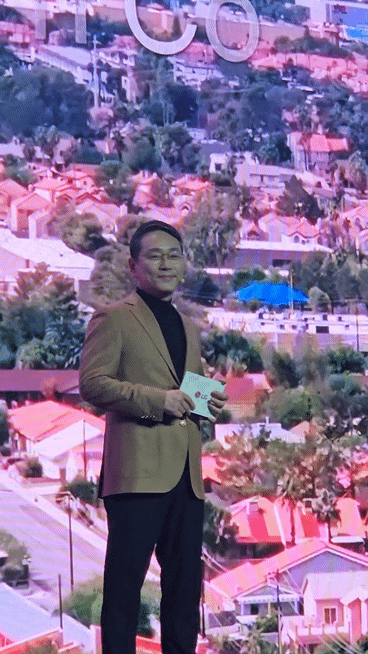스웨덴 한림원이 일본계 영국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기면서 한국 문단의 노벨 문학상 배출은 다시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노벨상 예측 기관인 영국 도박사이트에서 고은 시인의 배당률 순위가 막판에 선두 그룹까지 치고 올라온 터라 수상 실패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짙다.
한국 문학은 왜 노벨문학상 수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9일 서울경제신문은 문학계 전문가들에게 그 이유와 해법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첫째 한국 문학이 세계 각국의 독자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할 것, 둘째 정치·사회적 맥락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 삶의 근본적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할 것, 셋째 ‘쏠림 현상’이 심한 번역 지원군을 다양화해 차세대 작가를 적극 발굴할 것, 넷째 남미의 ‘마술적 리얼리즘’과 같은 한국 문학 특유의 코드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우찬제 서강대 국문과 교수는 “번역 수준은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지만 한국 문학의 담론을 널리 확산시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외국 독자들이 아시아에 중국·일본 문학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문학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찾아 읽게 되는데 지금처럼 작가들이 해외 나가서 낭독회 한번 하고 돌아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음사 대표를 지낸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도 “단적으로 말해 뉴욕타임스나 가디언, 르몽드 같은 유력지에 우리 작품이 소개돼야 해외 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며 “한국문학번역원을 문인들끼리 운영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해외 출판계에 정통한 전문 에이전트들을 하루빨리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품의 질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사회사적이고 정치사적인 맥락을 찾을 수 있는 소설은 많지만 그 작품들은 시대 환경을 떠나 버리면 의미가 반감되고 만다”라며 “한국문학이 인간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인훈과 황석영, 박완서, 김지하 등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했으나 번역 미비 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며 “시대적 맥락과 배경이 낳은 작가들이 사라지고 나니 인간 본성의 심원한 밑바닥을 끈질기게 건드릴 수 있는 젊은 작가군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수 대표 역시 “역사적 배경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인간성의 존엄을 얘기하는 문학 작품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작가의 내적 고민을 모든 세계 시민의 언어로 치환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분투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강우성 서울대 영문과 교수는 “해외에서 상만 받으면 한국 문학의 활로가 단숨에 뚫릴 것이라는 환상을 갖기 이전에 작품 내적인 충만을 지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정 작가들에게 번역 지원이 편중되는 관행에서 탈피해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차세대 문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진희 은행나무 편집주간은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종의 예우 차원에서 주로 거장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곤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즘 노벨 문학상의 흐름을 보면 반식민주의나 반체제 투쟁 등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수상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한 차세대 작가들을 다양하게 지원해 해외로 내보내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한국 문학 특유의 ‘코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은수 대표는 “남미가 가브리엘 마르케스 등을 중심으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세계 문학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듯 우리도 한국만의 코드로 해외 독자와 ‘교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찬제 교수도 “중국 하면 붉은색, 일본 하면 단정한 다도(茶道) 문화가 떠오르는 것처럼 해외 시장이 한국 문학을 상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고유의 세계를 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