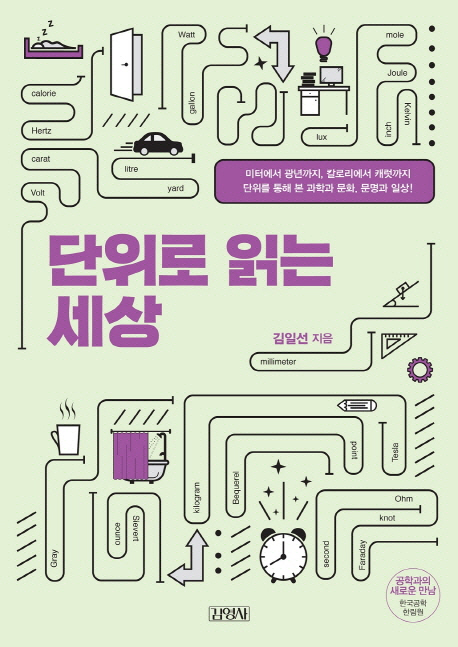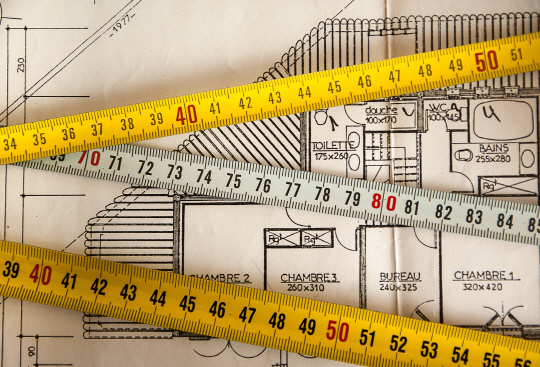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거나 풀다가 십자 홈을 뭉개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이럴 땐 앞서 나사를 세게 조여놓은 사람을 원망하기는 쉬워도 드라이버와 나사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보통 나사가 쉽게 뭉개지는 것은 미국의 인치 규격으로 만들어진 나사를 미터법 규격으로 만든 한국 드라이버로 조이면서 나사에 힘이 잘못 가해진 때문이다.
규격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실수는 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여객기 보잉 787 드림 라이너는 일본, 프랑스, 영국, 한국 등 여러 나라가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기종인데 이 항공기의 개발은 수차례 지연돼 보잉사가 제시한 계획보다 3년이나 늦게 인도됐다. 그런데 지연된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인치 단위계로 개발된 항공기에 맞는 나사를 한국, 일본 같은 미터법 사용 국가들이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란다.
어디 이뿐인가. 1999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화성기후궤도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던 중 불타버렸는데 그 이유는 탐사선 개발업체인 록히드마틴과 NASA가 정보교환과정에서 사용한 단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엉뚱한 값이 두 조직의 관제소 사이에 오갔고, 1억2,500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개발 기간 3년 더 걸린 보잉기
불타버린 NASA의 화성기후선
미터·인치 혼동이 가져온 실수
서울대 공과대에서 제어계측공학을 전공한 김일선 박사가 쓴 ‘단위로 읽는 세상’은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박힌 ‘단위’라는 창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현대사회를 조망한다.
우리는 매일 같이 시간, 온도, 거리, 속도, 습도 따위를 파악하고 수치로 변환하며 추상성을 극복한다. 하물며 팔다리와 척추가 적절하게 움직이도록 근육을 조절하기 위해서 땅바닥을 비롯한 주변 사물과의 거리,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자극의 정도를 끊임없이 측정해야 한다. 잠에서 깬 시간부터 잠이 들기까지 쉴 새 없이 재는 행위를 하는데 오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귓속에 들어 있는 세반고리관을 이용해 가속도를 느끼고 아직 담당 기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했지만 온몸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단위는 문명 이루게 해준 도구”
인류역사·현대사, 단위로 재조명
이런 인간에게 자연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이자 자연을 바라보는 창문으로서 숫자와 단위의 발명은 필연적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불변의 단위를 찾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인간은 자연표준을 활용해 불변의 단위를 만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자연은 불변하지 않을뿐더러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패권을 잡으려는 인간의 욕망도 컸다. 지구 둘레의 4,000만분의 1로 시작된 ‘1미터의 정의’는 숱하게 바뀌다가 1983년에 이르러 ‘빛이 진공에서 2억9,979만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로 정해졌다. 물론 이 역시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 진공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조차 정확한 1미터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단위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계약과 합의의 산물이며 이 역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저자는 단위가 “인간 지식의 결정체이자 문명을 이루게 해준 도구”라는 증거들을 쉬운 문체로 풀어낸다. 하나의 단위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은 도량형이나 수레바퀴의 규격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상, 학문과 생각까지도 표준화하려 했는데 공포정치를 통해 15년만에 중국 전역에 도량형을 표준화할 수 있었다. 당시의 규격이 중국 전역에 얼마나 잘 뿌리 내렸는지 다시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조차 진의 도량형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강력한 제재와 법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올림픽은 미터법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최고의 이벤트였다. 미터법을 쓰는 프랑스인 쿠베르탱 주도로 기획된 올림픽은 모든 경기의 규칙을 미터법에 근거해 치렀고 미터법이 전세계에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뿌리내린 단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방식이나 문화와 깊게 얽히는 탓에 한번 대중화된 단위를 대체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에선 1.8m의 사람이 ‘대(大)자’로 누울 만큼의 크기인 ‘한 평’을 미터법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대중은 물론 언론에서조차 1평에 해당하는 ‘3.3㎡’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평’ 단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영화의 신선도부터 메신저 대화에서 드러나는 호감도까지 수치화하려는 욕망이 들끓는 요즘 거꾸로 단위 뒤에 숨겨진 인간들의 이야기를 살펴본 저자의 관점이 흥미롭다. 1만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