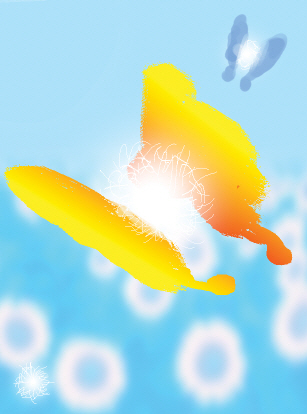짐짝을 등에 지고 날거나, 헬리콥터처럼 짐짝을 매달고 날아가는 나비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비는 바늘처럼 가벼운 몸 하나가 있을 뿐이다. 몸 하나가 전 재산이다. 그리고 무소속이다. 그래서 나비는 자유로운 영혼과 같다. 무소유(無所有)의 가벼움으로 그는 날아다닌다. 꽃들은 그의 주막이요, 나뭇잎은 비를 피할 그의 잠자리다. 그의 생은 훨훨 나는 춤이요, 춤이 끝남은 그의 죽음이다. 그는 늙어 죽으면서 바라는 것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그는 자유롭다.
사실 나비는 영업사원이다. 그는 천 개의 거래처 주막을 드나든다. 한 주막에서 한 잔씩 잔술을 마신다. 술에 약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 고치에서 깨자 배운 게 이 직업이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한 주막을 나서면 대낮에도 허공을 헛딛는다. 공짜 같지만 그의 어깨에 꽂혀 팔락이는 것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다. 눈치 빠른 주모가 끈끈한 암술 카드 리더기에 쓱 긁는다. 결혼정보업체에 등록된 수꽃들의 유전자 정보를 잽싸게 읽는다. 나비는 대개 초과 근로로 인한 과로와 영업상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나비는 겨울을 건너기 어렵지만 꽃들의 씨앗이 다시 눈을 틔우고, 우리가 내년에도 봄을 맞는 것은 그 덕분이다. <시인 반칠환>